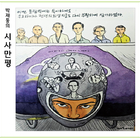미스매치(Miss-Match)로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일자리가 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일자리 미스매치’는 높은 학력의 인력들이 높은 임금에 안정된 고용형태를 갖춘 ‘좋은 일자리’만 선호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을식 연구위원은 30일 ‘한국의 고용 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국 실업자 47.3%에 달하는 40만명은 미스매치에 의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2.7%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다.
종류별로는 정보부족과 임금·근로조건 등 보상 불일치에 따른 마찰적 미스매치가 34.3%로 가장 많았고,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로 인한 구조적 미스매치가 13.0%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일자리 미스매치는 고학력의 대졸 구직자의 63.5%가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는 6.3%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고학력자들은 원하는 곳에 취업이 안될 경우 43.0%가 취업재수를 하거나 26.1%가 인턴·계약직 등에 종사하면서 구직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답했으며,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하겠다는 응답자는 18.0%에 그쳐 대기 실업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30대 직장인 96.0%가 직장 선택 시 근무지역을 고려하고, 49.8%는 지역이 지원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근무지역이 중요한 요건인 데 반해, 장거리 통근 등 거주 선호에 따른 직장과 거주지역 불일치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업무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과 주변 거점 도시의 특성을 살려 거주지로서 매력을 높이고, 수요 대응형 교통서비스를 도입해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로컬 프리미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별입지 공장들이 밀집한 화성·광주·양주 등 지역을 일정권역으로 나눠 읍면동 사무소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콤플렉스’의 조성과 주거지 이동을 위한 방안으로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도입 등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