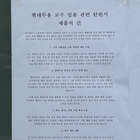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의 ‘이름표’ 작명을 놓고 고심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이름을 어떤 걸로 정할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출범할 정권인수위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정부 앞에 대통령의 이름이나 특정 브랜드를 붙이면서 당시 정부의 국정이념과 성격, 나아갈 방향을 함축해 왔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교체 때마다 이같은 고심을 거듭해 왔다.
역대 정권의 경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게 관례처럼 이어져오다, 지난 1992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이 군정종식의 의미를 담아 ‘문민정부’를 사용하면서 브랜드 명칭이 처음 도입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사용한데 이어,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명명하면서 굳어져 왔다.
현 정부는 ‘실용정부’, ‘실천정부’, ‘글로벌정부‘ 등의 지칭 방안을 검토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이명박 정부’로 명명됐다.
박 당선인 측은 현재 정부 앞에 특정 브랜드를 붙이는 방안과 함께 ‘박근혜 정부’로 부르는 방안을 동시에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당선인이 평소 민생을 강조해온데다, 후보 시절 유세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생부터 챙기고 다음 정부는 민생정부로 부르겠다”고 두 차례 언급한 바 있어 ‘민생정부’가 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