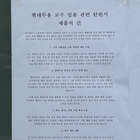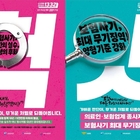‘박기춘 체제’가 대선 패배 후 방향을 잃은 민주통합당의 원내사령탑에 올라 ‘포스트 대선’ 이후의 향배가 주목된다.
일찌감치 ‘관리형 원내대표론’을 들고나온 박 원내대표는 “어느 계파나 파벌에 속하지 않은 제가 나서 그런(계파)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첫 일성을 밝히고 나서 새로 뽑힐 비대위원장과 함께 ‘투톱 체제’로 가동하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4개월여간의 시한부 자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의 정부·여당에 맞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찾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위원장과 함께 대선 패배 후유증을 추스르며 혁신과 쇄신 작업을 통해 당을 재건해 나가야 하는 책무도 주어졌다.
‘실무형’으로 꼽히는 그의 당선에는 대선 패배 후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돼온 친노 책임론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명숙-이해찬 대표 및 문재인 전 대선후보 배출 등을 거치며 당을 장악해온 친노·주류계에 대한 당내 불만과 반감이 확산되면서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시각이다.
그는 ‘이-박’(이해찬-박지원) 담합론으로 곤욕을 치러온 박지원 전 원내대표계의 핵심이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
그는 정견발표에서 “편가르기와 진영논리, 담합 등이 의원들의 의욕을 저하시켜 왔다”며 “계파의 이익을 떠나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의사가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대선 과정에서 후보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는 수모를 겪었다.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에 견뎠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어처구니 없는 주먹구구식 방침이었다”며 친노 주류측을 겨냥했다.
이 때문에 그의 선출로 당분간 친노계의 세 위축이 불가피해지는 등 당내 세력판도에도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 수석부대표를 두 차례 역임하며 대여 협상력을 어느정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적잖은 난관도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제1야당의 대여 전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으로서 그의 임무는 녹록지 않다. 당장 유통산업발전법과 세법, 택시법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 문제가 당면해 있다.
새해 들어서는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 이후 줄줄이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놓고도 국회에서 여야간 힘겨루기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 전 후보가 약속했던 정치개혁과 검찰·재벌개혁의 불씨도 살려가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