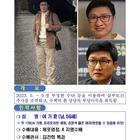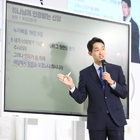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와 상속이 있다. 증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이전해주는 것이며, 상속은 내가 죽음으로써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율은 1억 미만에 대해 10%가 적용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은 40%,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상속세가 10억4천만원이지만, 상속재산이 40억원이면, 30억 초과분에 대해 50%를 적용해서 상속세가 15억4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증여세는 공제항목이 많지 않다. 영농자녀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공제로 5천만원 받을 수 있는데, 10년간 누적공제액이 5천만원이므로, 공제혜택이 크지는 않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주며, 상속받을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모두 있다면,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20억원을 가진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번에 증여를 하게 되면, 5천만원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 19억5천만원에 대해 6억2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한다.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는 가정하에 최소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2억4천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5억원을 증여하고, 나중에 15억원을 상속하게 되면, 증여에 대해서는 8천만원이 과세되고, 상속에 대해서는 9천만원이 과세되어 총 1억7천만원이 과세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사전에 재산을 쪼개서 증여를 한 후,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와 관련해 대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사전증여문제인데, 사람들이 누락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증여 후 10년이 지나고 사망해야 목표하던 대로 절세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이거나,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사람이 재산이 5억원을 넘는다면, 10년 이상의 장기플랜을 짜야만 효과적인 상속절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