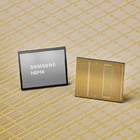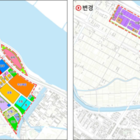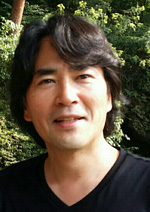
‘피에타(Pieta)’는 동정과 연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다. 이 단어가 거론되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3대 걸작 중 하나인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 그리고 독일의 사실주의 작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가 떠오른다. 필자는 이들을 볼 때마다 구현하고픈 한국적인 피에타의 모델이 있다. 죽음을 곧 맞게 될 아들의 수의(壽衣)를 직접 만들어 보내며 아들에게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으라”고 말한 조마리아(조성녀·1862~1927), 바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는 그의 작품 중 서명이 유일하게 새겨져 있다. 사람들 사이에 퍼진 “제작자가 미켈란젤로가 아니다”라는 소문에 화가나 남몰래 조각상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지만 곧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이름 하나 새기지 않았는데 나는 부끄럽게도 내 이름을 새겼구나”라고 후회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양심과 감수성이 당대의 거장으로 성장하는 소양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세상에서 가장 뼈저린 장면이 죽은 자식을 마주한 부모의 모습일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종교적인 성스러움으로 승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반면 전쟁에서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콜비츠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은 나약한 존재의 처절한 절규와 죽은 아들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비통함을 잘 묘사해 내고 있다.
우리에게는 위 두 작품보다 더욱 참담하며 또 다른 승화를 자아낼 수 있는 피에타의 사연이 있으니 바로 조마리아의 일화이다. 사람들은 조마리아를 두고 ‘독립운동의 어머니’, ‘여걸’이라고 칭하며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를 널리 읽히며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곧 죽을 아들의 수의를 만드는 어미의 처참한 심경을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분명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홀로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였을 것이고, 그 불빛 아래 바늘을 들고 있는 손마디와 손톱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톱이 모두 빠지고 손마디가 잘려나가는 고통으로 아들을 살려내었으면 하는 바람이 왜 없었을까. “비굴하더라도 목숨만큼은 구하여라”라는 독백이 수없이 뇌리에 흘러갔을 것이다.
우리는 ‘한(恨) 많은 민족’이다. 터질 듯한 극적인 상황에도 터뜨리질 않고 ‘절제와 균형’을 유지해내는 감성적 특징 때문에 한을 남긴다. 제발 가지 말라고 붙잡고 애원하는 대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로 마무리하는 아리랑에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두 발은 내 것인데 저 두 발은 뉘의 것인고?’라며 춤추며 절제하는 처용가,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라는 소월의 시(詩)에서도 우리 정서의 특징인 절제와 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네는 홀로 통곡을 거듭하고서 끝내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몰아쉬고 포기와 이성적 행동을 갖추게 된다. 아들의 죽음을 앞둔 어머니 조마리아 역시 분명 그랬을 것이다. 남 몰래 피눈물을 한없이 흘렸을 것이며, 결국 큰 한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우리가 시모시자(是母是子)를 논하며 위대한 어머니와 아들을 치하하는 동안에 한 아들의 어머니인 조마리아의 한을 어떤 식으로 달래드릴지 몰라왔다. 곧 죽을 아들을 차마 보지 못해 면회 한번 가지 않았고 죽고 난 아들의 시신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한은 어찌할까. 조마리아의 묘지는 개발사업으로 소실되었고 안중근 의사의 유골도 어디에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미켈란젤로와 콜비츠의 피에타를 바라보며 조마리아 모자의 피에타를 만들고 싶다. 100년의 세월을 훨씬 넘겼지만 피에타로 두 모자간의 상봉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2월14일)에 전국은 연인들의 초콜릿 파티장이 된다. 또 매년 한 번씩 독립유공자협회에 주던 용돈도 9년씩이나 매정히 끊었던 오늘의 현실에 ‘조마리아와 아들의 피에타’는 지나친 바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