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두아르트 보흘렌’의 유해
“나미비아”라는 아프리카 국가는 우리에게 낯설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어져 대서양으로 향해 있는 이 나라는 20세기 초반 제국주의 시절 독일이 지배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해안(Skeleton coast)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사막에 낡은 골조가 앙상하게 드러난 증기선 한 척이 유해(遺骸)처럼 파묻혀 있다.
기이하지 않은가? 바다에 있어야 할 배가 어찌해서 사막에 버려진 채 그렇게 있는 것일까? 이 증기선의 이름은 “에두아르트 보흘렌(Eduard Bohlen)”으로 1909년 이 해역에서 난파한 채 있다가 지난 100년 사이에 사막이 바다에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이런 난데없는 고고학적 풍경을 만든 것이다.
이 해안이 ‘해골’이라고 불린 까닭은 제국 독일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이에 저항하면 대량학살을 벌였기 때문이다. 에두아르트 보흘렌도 애초에는 화물을 실어나르다가 이후 노예선으로 그 기능이 바뀌었고 좌초 당시에도 원주민들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던 중이었다. 제국주의 시대가 가한 폭력의 잔재가 사막에 폐가(廢家)와 같은 흔적을 남긴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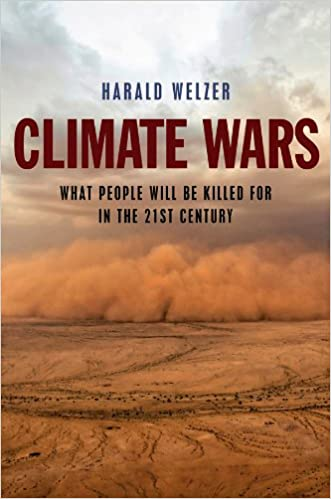
<기후전쟁(Climate Wars)>을 쓴 독일의 사회학자 하랄트 벨처(Harald Welzer)는 사막에 버려진 이 배의 모습이 바로 21세기 서구 문명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일깨우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와 폭력에 대한 연구를 해온 인물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화석연료를 탈취하면서 마구잡이로 써서 성장해온 서구의 모델은 그 지속가능하지 않는 현실을 이제 더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 침묵의 봄, 기후전쟁
인류문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한 당대의 세계적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결성한 ‘로마클럽(Club of Rome)’이 1968년 기획해서 1972년 정리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 가 이미 경고했던 것도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지구는 유한한데 그걸 한없이 뜯어 쓴다면 결국 자멸이 기다린다는 경보(警報)는 물질적 성장 논리에 압도되고 말았다.
당시로서는 첨단의 컴퓨터 기술로 데이터 처리를 한 이 보고서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부인”과“거부”였다. 자본주의의 축적 논리와 동력에 대한 전격적인 비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살충제나 제초제가 농지에 가하게 되는 생태적 폭력을 고발했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겪었던 운명과 다르지 않았다.

1962년에 출간된 이 책은 미국의 산업계에 분노와 반발을 불러왔고 레이첼 카슨은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결국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는 점차 입증이 되고 지구 생태계의 생명력을 지켜내는 운동이 시작된다. 흙, 바다, 강, 나무, 곤충, 동물들의 건강이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우친 셈이었다.
생태적 관점으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을 파헤쳐온 존 포스터 벨라미가 짚어낸 “생태적 균열(ecological rift)”은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가져오는 비극을 말해준다. 자본주의는 결국 자연을 도구화하는 조직 시스템인데 그 과정에서 저렴한 자연과 저렴한 노동을 강제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자본축적을 진행해온 이 체제를 허물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처럼 이 생태적 균열을 한 사회의 주요의제로 삼지 못했던 것은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체의 무능력에 있었다기 보다는 이런 생태적 관점이 가진 비판의 힘을 소멸시키는 기존의 지배 카르텔의 정보조작과 여론오도에 있다는 관찰이 옳을 것이다.
- 거짓정보와 싸우는 전사
마이클 만은 기후변화가 20세기 들어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위기로 치닫는 형세를 ‘하키 스틱’으로 표현해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최근 펴낸 <새로운 기후전쟁(The New Climate War)>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부정과 기만,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식의 연기론을 이들 지배 카르텔이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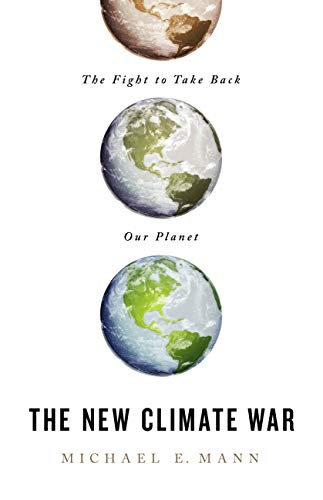
그는 지배 카르텔이 거짓 정보와 오도를 의도적으로 설계해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들을 공격, 그 사회에서 공적(公敵)으로 만들어 퇴출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레이첼 카슨도 살충제 기업으로부터 ‘공산주의자’, ‘히스테리에 가득 찬 여자’로 공격과 모욕을 받았다.
마이클 만은 입센의 희곡 <공적>도 바로 그런 사회의 내부 역학을 드러낸 작품이라면서 미국에서도 기후위기 경고론자들을 “미국인들의 적(enemy of the American People)”처럼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탈원전 운동가들이 이런 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낯설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사대상으로까지 삼았으니 그 심각성은 끔찍할 정도다.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거짓정보를 지배 카르텔이 지구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과학자들로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증언은 일종의 전투행위가 된다. 그렇게 할 용기가 없으면 입을 다물게 된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과학적 침묵(scientific reticence)”이 그렇게 유통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용기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과학의 진실을 사회적으로 발언한 칼 세이건을 마이클 만이 “전사(warrior)”라고 한 것은 타당하다. 세이건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고 지구가 인류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창백하고 푸른 점(pale blue dot)”이라는 걸 일깨웠다. 기후위기에도 이와 똑같은 논리와 인식이 요구된다.

존 캅(John Cobb)은 저명한 신학자다. 그는 ‘과정신학’이라는 영역을 열어나간 인물로 “생태신학”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그는 과정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자연에 대한 친교의 자세를 지닌 철학자 화이트헤드(Whitehead)를 자신의 신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여긴다. 그 존 캅이 <이제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Is it too late?)>이라는 책에서 하랄트 벨처가 말한 사막의 배와는 또 다른 배 이야기를 꺼낸다.
1등석에 있는 선객들은 화물칸 바로 위에 있는 3등석 선객들이 무얼 먹고 어떻게 항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들은 자기들 만의 방에서 안전하다. 그러나 배밑창이 처음에는 작게 뚫렸다가 점점 커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지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당연히 3등석은 아우성이 되고 1등석은 아직 위험이 오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단한 서사가 아닌 듯 하지만, 존 캅이 기후위기의 현실을 빗대어 이 이야기를 한 게 1972년이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놀라운 예언과 통찰이다. 결국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면 1등석이고 3등석이고 간에 모두 몰살당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로 결합하는 것만이 답이다.

-난폭한 생태상어, 어떻게 해야 할까?
<서구의 흥기(The Rise of the West)>를 써서 토인비 이후의 문명사가로 이름을 날린 윌리엄 맥닐의 아들 J.R. 맥닐은 <환경의 역사(Something New under the Sun)>로 자연사와 인류사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길을 연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 문명의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꼽는다. 어마어마한 환경파괴의 화학물질을 써대면서 땅과 바다, 하늘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를 “생태상어(ecological shark)”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생태계의 폭력적인 포식자라는 뜻이다. 이와 맞서서 생태계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전사의 용기”를 요구한다. 더군다나 이 상어가 지배하고 있는 생태계에서는 상어가 깨평처럼 나눠주는 것들로 중독이 되어 있다.
기후위기의 뿌리가 되고 있는 화석연료 시스템은 우리를 그렇게 중독시키면서 상어를 내쫓을 엄두를 못내게 하고 있다. 정치는 화석자본(fossil capital)이 주는 돈으로 부패한 지 오래이며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여긴다. 그러니 기후약자들을 발생시키는 불평등 구조를 혁파할 “기후정의(climate justice)”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그린 뉴딜은 바로 이런 의지를 가진 정치적 전투의 결과물이다. 코르테즈 하원의원 등이 제출한 그린 뉴딜 법안 결의안 제목은 “그린 뉴딜을 창출해내야 하는 연방정부의 의무를 인식하며”이다.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다수가 희생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재생에너지 의존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여기에는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선라이스 무브먼트(Sunrise Movement)”등의 기후비상행동 시민운동의 역할과 성장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최저임금, 8시간 노동, 노조 결성권, 오버타임 지급, 사회보장제도 등을 이뤄낸 1930년대 뉴딜의 경험과 성과가 기본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반드시 기억할 바가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은 그냥 나오지 않았다. 실업자가 되면서 임대료를 내지못해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된 노동자들이 인권변호사들과 힘을 합해 퇴거명령서를 발부한 사법부를 둘러싸고 전국에서 시위를 벌인다. 1934년의 일이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1935년“노동과정국(Works Process Administration/WPA)”으로 이 부서의 정책을 기준으로 놓고 뉴딜은 노동자 중심의 방향성을 잡는다. 이러한 상황도 기업의 반발로 같은 해 대법원이 뉴딜의 “경제부흥법(Recovery Act)”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타격을 받지만, WPA는 살아남아서 뉴딜이 만들어놓은 최저임금제 등의 성과를 일정하게 지켜내게 된다.
우리 대선의 정국에서 기후위기가 주요담론으로 등장해야 마땅하다. “기후정의”를 헌법의 기본권으로 넣자는 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은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다. 그것이 가지게 될 위력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 애초에 약자를 만들지 말라!
<그린 뉴딜, 그 이상을 향해(The Green New Deal and Beyond)>의 저자 스탠 콕스는 더는 ‘성장의 논리’에 묶이지 말고 지구 전체의 정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운동을 누가 알아보고 함께 할 것인가?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한 정치인의 북 컨서트에서 기후행동에 나선 청소년 활동가 김서경학생이 했던 말이 여전히 충격으로 남는다.

“애초부터 약자를 만들지 말라. 정의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닌가?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약자를 만들지 않아야 할 정의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상어가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다. ‘기후악당’이라는 포식자다. 싸움에 나서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