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르투스와 포르투나
‘비르투스(Virtus)’라는 라틴어는 ‘미덕(美德)’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virtue’의 뿌리가 되는 말이다. 전쟁을 통해 국가의 힘을 확장했던 고대 로마에서 비르투스는 우선 전사(戰士)의 주력부대일 수 밖에 없는 남성들의 “용기”를 뜻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에 대한 용기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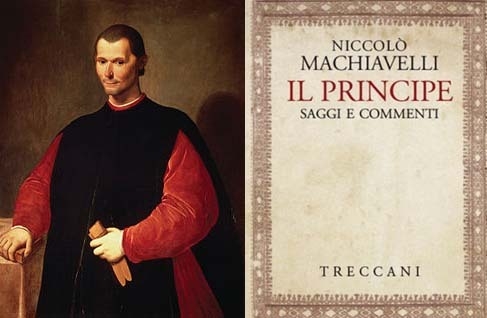
<로마사 논고(論考)>를 쓴 마키아벨리는 역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군주론>을 썼는데 그가 돌파하려 했던 것은 “운명”이었다. ‘포르투나(fortuna)’라고 불린 운명은 이미 신에 의해 정해진 경로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었고, 용기는 이와 대결해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는 ‘자질(qualita)’이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따라서 바로 이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제왕학(帝王學)이었다. 1469년에 태어나 1527년에 세상을 떠난 그가 살았던 당대의 이탈리아는 외세에 휘둘려 분열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민중들의 삶은 따라서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고 재난이 겹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가혹한 폭정”에 시달렸다.
그러니 이탈리아의 독립과 그에 기초한 정세의 안정은 절박했다. 이걸 감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용맹한 “절세의 지도력”이 요구되었다. 신이 이미 그어놓은 운명의 경계선을 넘는 행위는 로마에 앞선 ‘그리스 비극’의 절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고 올라 그 산을 정복하는 일이었다. 비범한 자질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와 도덕률의 분리 : 선(善)의 역설
그런 까닭에 마키아벨리에게는 기독교 세계의 윤리가 가르쳐온 도덕률에 묶이지 않는 인간형이 등장해야 했다. 선하고 덕스럽고 자비롭게 처신하다가 자칫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이들이 약탈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보다는 필요할 때에는 냉혹한 태도로 기강을 잡아 전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이들을 지켜내기에 도리어 자비롭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데다가 기만에 능하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인간들을 믿고 행동하다가는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한다. 선(善)을 중심축에 놓는 정치는 자칫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무력한 정치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짓밟아 뭉개야 하는데 사소한 피해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움을 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절제의 태도’를 일깨운 셈이다. “군주는 너무 우유부단해서도 안 된다.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애롭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너무 많아 주변을 힘들게 해서도 안 된다.”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조건이 있다. “사랑도 느끼게 해야 하며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탁월한 자질을 가진 군주는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 알아야 하며 그중에서도 “사자와 여우를 모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으니 함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제압하려면 사자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치공학”의 가치를 설파한 격이다.
-마키아벨리의 괴물
마키아벨리의 이와 같은 제왕학은 잘 알고 있는 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목적에 동의가 되면 수단이 가지고 있는 반윤리적 본질을 납득해주는 자세가 필요해진다. 상대가 악할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자질”은 절실해질 수 있다. 선하기만 한 인격이 악과 싸워 의(義)를 세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선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짐승과 인간을 조화시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행위의 주체가 괴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게 된다. 정치와 윤리를 분리시킨 마키아벨리 이후 근대 서구의 정치적 비정함과 야만은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받아 만들어졌다. 수단이 목적을 잡아먹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는 약탈을 막겠다고 했지만 거꾸로 약탈을 저지르는 것이 주가 되고 만 파시즘과 제국주의는 그 절정이었다. 야만의 폭정을 막는 정치기술을 전도한 마키아벨리는 도리어 그 야만의 폭정을 조장한 원흉처럼 되고 말았다.
이와는 달리, 동양에서 유교정치의 수양론을 담은 <대학(大學)>이 “덕자본야(德者本也)”라는 문장으로 덕(德)이야말로 근본이라고 강조한 까닭은 분명하다. 하늘이 내린 인간의 본성에 담긴 선함을 추구하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면 이를 도외시하는 순간부터 짐승의 시간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유를 지킨다는 점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야만, 폭정의 괴물을 축출하는데 힘을 쏟는다. 무엇보다도 권력자의 내면을 바로 잡아나가는 치열한 노력이 없게 되면 그 고통은 즉각 민중의 삶에 덮친다.
바로 여기에서 “현인(賢人)의 정치”, “철학적 가치를 체화한 제왕의 정치”가 요구된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 그의 <국가론>에서 설파한 ‘철인왕(哲人王)’은 현인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충격의 산물이었다. 권력자가 현자(賢者)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플라톤에 앞서서 고대 동양 정치사상과 윤리에 깊고 깊게 뿌리박은 전통이다.
-<성학집요>, 군주에게 직언하다
조선시대에 “삼사(三司)”로 불린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은 각기 기능은 차이가 있으나 종합해보면 모두 군주에 대한 직언(直言)의 기관이었다. 충신(忠臣)은 군주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직언의 용기를 가진 이를 뜻했다. 그렇지 않은 신하는 아첨꾼이라고 보면 된다고 여긴 것이다. 그게 바로 간신(奸臣)이다.
그러나 직언을 즐겨 듣는 군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사간원”이며 왕을 교육하는 경연(經筵) 제도였다. 왕과 신하가 고전을 함께 읽고 정책을 토론하고 왕의 품성과 사유를 훈련시키는 자리로 이 경연을 좋아하면 성군(聖君)이요 아니면 폭군이 되는 셈이었다.

율곡 이이가 집필한 <성학집요(聖學輯要)>는 송의 진덕수가 지은 제왕 지침서 <대학연의(大學衍義)>와 쌍벽을 이룬, 조선 후기 유일하게 경연에서 선택된 우리 학자의 강연교재다. 선조(宣祖)를 교육하고자 했던 동기로 쓰여진 <성학집요>는 영조와 정조가 특히 즐겨 읽은 교과서였다.
율곡은 자신이 이 책을 집필한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제왕의 학문에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에서 지혜롭고 바른 신하를 쓰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제왕지학(帝王之學) 막절어변화기질(莫切於變化氣質) 제왕지치(帝王之治) 막선어추성용현(莫先於推誠用賢)”
지도자의 기질이 덕스럽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가기 마련이다. 자기의 품성과 내면을 닦아 그걸 힘으로 정치를 하라는 것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요체다.
그런데 군주의 허물을 일깨우는 것은 자칫 미움을 사 징벌을 겪게 되거나 목숨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성학집요> 집필의 대상이었던 선조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소를 올린 조헌의 경우, 올린 상소를 모두 불태우고 그를 귀양보내버리고 만다.
이퇴계와 기대승처럼 율곡과 학문의 동지였던 성혼(成渾)이 당파싸움에 휘몰려 비난을 받고 억울함을 겪는다 여긴 제자들이 올린 상소에 선조가 아무 답을 하지 않자 조헌이 홀로 용기있게 항변했던 일이었다. 군주에 대한 직언은 이렇게 무엄한 일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율곡은 마음에 거슬리는 말은 도리(道理)에 맞는지 돌아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도 도리에 따져보고 자기 마음을 어기는 말을 싫어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보통의 인내심과 인격적 성숙이 있지 않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자신을 굽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이기려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십시오. /무치어굴기(無恥於屈己) 이거호승지사(以去好勝之私)”
허물이 지적되었을 때 그걸 분노하거나 부인하려 들면서 직언을 억눌러 이기려는 마음은 사사로운 소인배와 다를 바 없으니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도 아첨꾼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직언을 들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듣더라도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알리라”고 권한다.
물론 이런 직언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게 되면 함부로 굴어 권위가 손상되니 그럴 만한 사려깊은 사람에게만 허용하되 요청할 때만 입을 열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니 우리의 사헌부나 군신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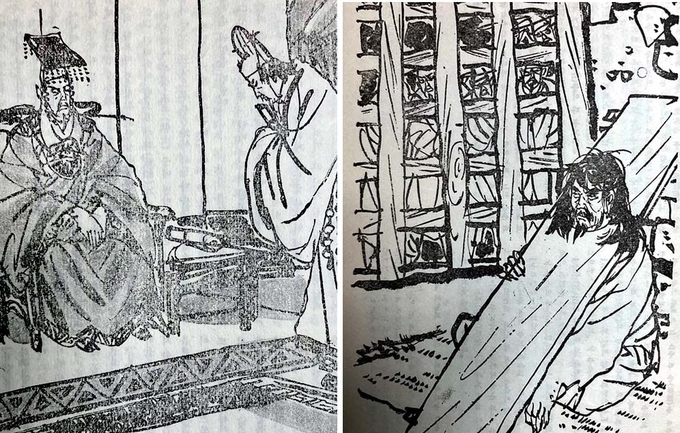
-<군주론>과 <성학집요> 사이에서
2022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공간이 열렸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지도자에 대한 선택은 당연히 혈통세습으로 이루어지는 군주제도와 다르다. 그러나 율곡이 제대로 내다보았듯이 “지도자의 몸은 만 가지 일이 모이는 중심”이라는 점에서 “자질(qualita)과 기질(氣質)에 대한 평가, 판단”은 여전히 중대하다. 정치는 시스템의 차원도 있으나 지도자의 인격적 차원이 훨씬 강력하게 결정력을 갖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군주론>과 <성학집요> 사이에 우리의 현실은 존재한다. 도구적 자질에만 집중할 경우 그걸 선택하고 판별하는 기본능력인 인격적 기질을 놓치게 될 것이며 인격적 기질만으로 판단할 경우 역사의 포루투나(fortuna)를 이겨낼 역량 차원의 자질을 짚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래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진화를 하는 인간, 지도자가 소중해진다. <논어>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제자 자공(子貢)이 인격 도야의 과정을 시(詩)를 짓는 과정과 비유하며 깨우치니 공자가 이를 칭찬하는 가운데 나온다. 끊고 다듬어 형체를 만들고 난 뒤 그걸 정교하게 쪼아내고 갈아 꼴을 완성시키는 도약(跳躍)의 노력을 매일 하는 이가 우리 모두를 각성시키는 지도자이다.
지금의 능력과 인격만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단히 넘어 새로운 지평을 스스로 여는 인간, 그렇게 변화하는 그만큼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아도 함께 변모해나갈 것이다.
정치공동체는 갈등의 해결과 사회적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인간진화를 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의 퇴화를 가져오는 인간형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가 세우는 정부는 우리의 교사(敎師)가 되어야 한다. 정치는 인간에게 영원한 교육의 모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