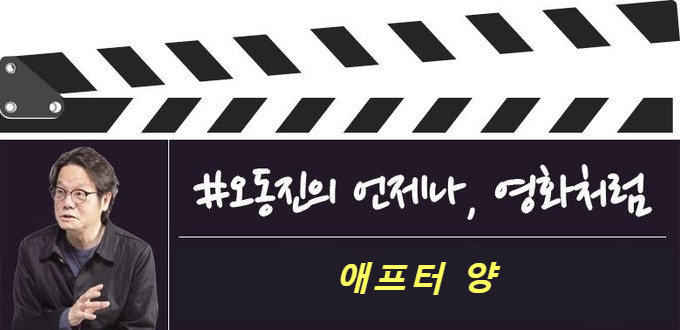
코고나다의 영화 ‘애프터 양’은 기이한 작품이다. 미래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영화 속 등장인물 모두 과거를 사변하려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 하거나 또 실제로 얻는다. 그래서 이 영화는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곧 현재의 이야기다. 그건 알렉산더 와인스틴의 원작 단편 ‘양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기(Saying Goodbye to Yang)’가 직시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미래에 대한 상상을 통해 현실을 바꾸려는 것, 그렇게 성찰하는 것, 바로 SF영화와 문학의 지향점이다.
‘양’은 안드로이드다. 그런데 가족과 진배없다. 아니 그냥 아들이다. 제이크(콜린 파렐)와 카이라(조디 터너 스미스) 부부는 서로를 비교적 열렬히 사랑하지만 아이가 없다. 그래서 입양을 한다(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도 입양을 했었을 수도 있다). 중국인 아이 미카(말레아 엠마 찬드로위자야)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일찌감치 자신들의 혈육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제이크는 백인, 카이라는 흑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둘은 아이가 자신의 중국쪽 토대를 잊지 않게 하려고 보육교사 겸 아이 돌보미를 집안에 들인다. 그게 중국계로 보이는 ‘양(저스틴 민)’이고, ‘양’이 바로 안드로이드다.
그런데 이런 설명 모두가 이 영화의 전사(前事)이다. 실제 영화에서는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대사 한 줄로 처리되는 부분이다. 이 영화가 갖는 그 같은 생략, 그 같은 점핑 컷, 그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겪게 되는 사고의 추출 과정, 그 상상력의 전개는 한편의 문학적 서사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것이야 말로 이 작품이 갖는 매력 중 하나이다.

문제는 ‘양’이 고장이 난다는 것이다. 고장난 ‘양’의 ‘부품’은 수리할 수 있는 것인 것인가.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하고 다른 안드로이드로 대체해야 하는 것인가. ‘양’을 대신할 안드로이드는 있는가. ‘양’의 주인, 그러니까 양부(養父)인 제이크는 고민에 빠진다. 딸 미카는 매일 같이 오빠가 보고 싶다고 울먹인다. 제이크와 카이라 부부는 그 누구보다 미카를 사랑하지만 ‘양’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과 일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도래했음을 직감한다.
제이크와 ‘양’의 관계는 어쩌면, 신과 인간의 관계로 확장해서 해석될 수가 있다. 제이크는‘양’을 엄청 애정하지만 그렇다고 미카만큼은 아니다. 그저 아끼는 물건일 뿐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든 버릴 수 있다. 신도 그럴 수 있다. 인간을 엄청 애정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전체만큼은 아닐 수 있다. 신도 언제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폐기하고 새로운 종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양’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유한의 존재이다. 생명이 제한돼 있다는 것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것이 유한의 실제 의미이다.
영화 속에서 제이크는 신의 사유를 대신해서 보여 준다. ‘양’을 버려야 할 때 사실은 ‘양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많이 슬프고 측은해 한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정작 ‘양’의 기억 속에는 제이크만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제이크가 알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놀람은 결코 배신감 같은 것이 아니다. ‘양’이 지녔던 놀라운 자유의지에 대한 경이로움이다. 그가 개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놀라움이다. 신도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늘 그런 점들이 놀랍고 흥미로울 것이다. 어쩌면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양’이 제이크처럼 점점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갖는 존재로 진화하는 것이나(‘양’은 사실 연애를 했다), 인간이 점점 신을 닮으려 애쓰고 있는 점이야 말로 신이 인간을 애정하고 지키려 하는 진짜 이유의 요체일 수 있다.
영화 ‘애프터 양’은 신과 인간의 애정관계라는, 그 기쁨과 슬픔을 교차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다. 제이크와 카이라 부부는 결국 ‘양’의 존재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시킨다. 버리지만 버리지 못한다. 이 영화의 후반부는 그런 점에서 왠지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데, 신이 결국 인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애프터 양’은 장면 하나하나마다에 엄청난 공을 들인 흔적을 보여 준다. 예컨대 ‘양’의 데이터를 통해 과거 그와 함께 했던 메모리를 꺼내는 장면이고, 그것을 복기하는 장면들이다. 제이크는 언젠가 ‘양’에게 다도(茶道)에 대해 가르쳤다. 차 한 잔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 숲과 바람과 향기와 습도 등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느낌이 날 만큼 차를 우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친다. 차를 한잔 내리고 단숨에 꿀꺽 마시자 ‘양’이 묻는다. “어떤 맛인가요”. 제이크가 말한다. “잘 모르겠어”.
인생은 그렇게 차 한 잔과 같아서, 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지만 실제의 삶은 그 같은 명료한 이치에 한 치도 다가서지 못할 때가 많다. 다도와 인생은 같은 것이라는 것 그건 제이크와 양, 둘의 관계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제이크는 ‘양’의 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치도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 결국 차의 맛처럼, “잘 모르겠다”가 결론이다. 그는 어떻게 할 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애프터 양’은 인류사회가 이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을 때가 왔음을 선포하는 척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속의 가족관계는 매우 코스모폴리탄적이고 비(非)인간화를 인간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했으며, 그리하여 가족은 실존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이지, 존재 그 자체의 문제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제 선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주의를 벗어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전통의 가족주의가 낳아 온 계급과 계층의 세습, 그 자본의 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럴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지만 꼭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영화는 훨씬 더 철학적이고 근본적이다.
‘양’은 언젠가 엄마인 카이라와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한다. “애벌레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을 세계의 다른 존재들은 나비라고 부르죠(What the caterpillar calls the end, the rest of the world calls a butterfly)”. 엄마가 묻는다. “노자 얘기니?” 그렇게 영화는 노자의 철학을 가르쳐 준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며 그건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 준다.

사유하는 SF인 만큼 여러 가지 요소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했던 영화이다. 특히 음악이 그렇다. 사카모토 류이치와 아스카 마쓰미야가 이뤄 낸 피아노 건반의 단음들은 오히려 풀(full) 구성의 오케스트라가 만들어 내는 장중한 음악 마냥 이 영화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장시킨다.
제이크-카이라 부부의 집이 일본 전통 가옥의 느낌인 것은 연출자 코고나다가 일본의 거장 오즈 야스히로의 공간을 답습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독립돼 있으면서도 연결돼 있는 느낌 같은 것이다. 미카는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러 나오곤 하는데 미닫이문을 하나 열고 거실에 앉아 있는 아빠 등 뒤를 지나 또 다시 미닫이를 열고 주방으로 간다. 아빠 등 뒤는 유리벽이다. 미카는 움직이지만 제이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의 고요한 동선은 영화 내내 이어진다.
다이얼로그보다는 독백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사실은 독백과 다이얼로그가 겹쳐져 있다. 사람은 먼저 기억 속에서 대화를 꺼내기 때문이다. ‘양’이 했던 얘기가 먼저 내 기억 속에서 플레이 되고 그 다음에 장면이 떠올라서 다이얼로그 전체가 펼쳐진다. 그래서 처음엔 같은 대사가 중첩된 느낌으로 전달된다. 단순한 메모리와 기억 자체를 소환해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건 지식과 지성의 차이와 같다.
소설 원제처럼 ‘양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기(Saying Goodbye to Yang)’라고 영화 제목을 붙였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 수도 있었을까. ‘양’이 안드로이드였다는 점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을까. 그보다는 ‘양’의 폐기 여부를 놓고 사람들이 벌어지는 논쟁 아닌 논쟁, 사유 아닌 사유들이 더 그럴 것이다. 오랜만에 뇌가 깨끗한 물로 씻겨 나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영화는 종종 그렇게 쓰여야 한다. ‘애프터 양’이 그런 영화이다. 그래서 권하게 되는 영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