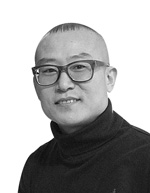
무수한 광고들은 우리를 소비하는 인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소비하는 인간들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유발하여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문명을 일으켰지만 인문을 타락시켜온 우리 경제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쓰나미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흐름은 해안가 방파제의 밑돌을 뽑아서 기득권과 대기업의 담벼락을 만들거나 방품림을 벌목해서 특권층 별장의 기둥을 만들어 오던 중 맞이한 경제 쓰나미 또는 폭풍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 곳곳에 짓다 만 집이나 빈집이 늘어나서 결국 부동산 버블이 터질 일은 1차적으로 국정의 실패이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특정 국가나 특정 권력이 주도하는 흐름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작은 혁신이 모여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던 패러다임에는 각자의 이기심을 채우도록 사유재산을 허용하면 모두 부자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성장이 만든 꽃이지만 열매는 아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IOT와 AI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야 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보는데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병든 감나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기업은 일단 작은 꽃을 피우지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병충해를 입은 감들은 작은 열매일 때부터 낙과를 시작한다. 더 강한 플랫폼 중력에 흡수되는 것이다. 글로벌 ICT기업의 경쟁도 이와 비슷하게 누가 태양계의 중심이 될지를 놓고 중력의 경쟁을 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태양계는 생태계라고 부른다. 그리고 생태계의 중력은 플랫폼이 만든다.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말은 가장 강한 중력을 갖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그 생태계의 중력인 플랫폼을 장악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박애정신에서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더 인간적인 변화가 더 큰 중력을 만든다. 이렇게 편의와 박애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영비용과 거래비용, 복잡성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합쳐지면서 그 숫자가 줄어드는 법칙이 바로 코스의 법칙(Coase’s Law)인데, 기업의 발생 기원에 대해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주장한 현상이다. 앞으로 지구상의 99% 이상의 기업들은 이 코스의 법칙이 자기 기업에도 적용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이니 광고도 모이고, 뭔가 팔고 싶은 기업들도 모여들어 생태계를 만든다. 플랫폼이라는 생태계가 커질수록 따라오는 이익은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커지면서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용은 급격히 줄어들어 코스의 법칙을 따른다. 기업이 속도가 느리거나 규모가 작은데 독특함도 없다면 그 기업은 더 큰 중력의 기업에 흡수된다. 플랫폼 기업의 중력이 급속히 커지는 이유는 메카프(Metcalf’s law)의 법칙 때문인데, 컴퓨터 산업이론 및 컴퓨터 네트워킹 개발을 일찍 연구한 사업가 로버트 메카프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급격히 커지며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말했다. 마치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중력에 의해 물질들이 모이는데, 많은 양이 모이면 목성이 되고 조금 모이면 타이탄이 되는 것과 같다.
플랫폼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수 제곱에 비례하지만 비용의 증가율은 점점 감소해서 결국 어떤 기업은 목성이, 어떤 기업은 위성이 된다. 필자가 보기에 삼성은 구글과 테슬라의 위성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떤 기업이 될까? 4차 산업혁명은 범용인공지능과 함께 등장하는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지구 전체 기업들의 태양은 AGI가 된다. 주인이 노예에게 의존하면서 노예가 주인이 되는 역전현상이 인간과 AI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국가의 권력이 다국적기업으로 이동한 이후에, 커뮤니티와 문화적 연대로 넘어가는 권력(관심)의 이동이 생긴다고 했는데,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독립한 AGI는 커뮤니티와 문화적 연대를 위해 기여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