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질학의 등장
암석(巖石)을 읽는 과학이 세상에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인 건 1830년 영국에서였다. 찰스 리엘(Charles Lyell)이 쓴 <지질학의 원리 (Principle of Geology)>는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땅속에서 역사를 발굴하는 지침서의 고전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런던 지질연구모임(Geological Society of London)”이 창립된 것이 1807년이니 20년이 채 넘지 않아 학문적 결실이 이루어진 셈이다.
찰스 리엘은 그의 책 첫 장에 지질학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밝혀 놓는다. “지질학이란 유기물, 무기물로 구성된 자연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를 탐구하는 과학이다. 또한 이런 변화의 원인을 비롯해서 그 변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행성의 표면과 외부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한다.”
지질학으로 지구가 얼마나 오래된 별인지,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이 지구를 거쳐갔는지를 알게 되었다. 무려 40억 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기록이 지구의 암석에 새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시작이었다.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한 찰스 다윈이 “런던 지질연구모임” 회원이 된 것은 1839년이었고 그가 지질학 연구로 출발해서 진화론에 이르게 된 것 또한 기억해둘 일이다. 진화론과 지질학이 발견한 것들은 무수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멸종”이다. 암석에 새겨진 화석화된 존재들이 더는 지구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바로 그런 현실을 입증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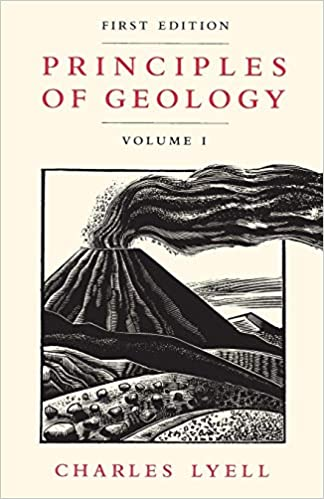
- 멸종의 기록과 ‘인류세’
이전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5억 년 전의 고생대를 ‘캠브리아기(Cambrian Period)’라는 지질시간대로 부르면서 이 시기가 1억 년 정도 유지되었다가 멸종으로 끝났다는 것도 알게 된다. 대폭발로까지 생각될 수 있는 생명체의 엄청난 등장이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엽충도 이 시기의 생명체이다.
네덜란드의 대기화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은 파울 요제프 크뤼천(Paul Jozef Crutzen)은 인류가 지구환경에 큰 영향을 준 시대를 지질학의 개념을 따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말을 대중화시켰다.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특히 1945년 핵무기 등장은 대기 중에 방사능, 이산화탄소의 급증으로 지구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가했다는 점에서 인류세는 지질학이 말하는 지층의 시대처럼 ‘제6차 멸종’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은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급증에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지구생성 과정의 초기는 산소가 지배하면서 산화(酸化)라는 독성환경이 생명체의 존속에 치명타를 가하는 환경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응이 바로 산소호흡체계의 등장이고 이를 통한 물질대사 과정은 생명진화의 전략적 기반이었다.
단순한 원핵세포(Prokaryotes)에서 산소호흡과정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와 태양에너지를 자기화하는 엽록체(chloroplast)를 가진 진핵세포(Eukaryotes)로 진화하는 것은 바로 그 전략으로 가능해진 이른바 ‘세포혁명’이다.
- ‘세포혁명’의 비밀
예수회 신부로 고생물학자로 북경(北京) 원인(原人)을 발굴한 떼이야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은 1955년에 발간된 그의 <인간현상(The Phenomenon of Man)>에서 “세포혁명(cellular revolution)”이야말로 생명체의 복잡계가 만들어져 의식의 세계가 작동하는 ‘정신계(noosphere)’로 진화하는 기초라고 주장했다. 놀라운 선견(先見)이자 탁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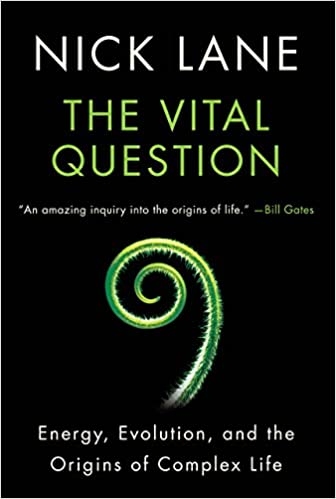
복잡계 생명체의 진화와 그 기원에 대해 정리한 <바이털 퀘스쳔(The Vital Question)>의 저자인 생물화학자 닉 레인(Nick Lane)은 이 세포혁명 연구의 가장 탁월한 업적이자 생물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론으로 1967년에 발표된 린 마굴리스(Lynn Margulis)의 “세포공생(endosymbiosis)” 개념을 꼽는다. 린 마굴리스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이미 고정된 세포의 진화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세포끼리 서로 협동해서 하나의 몸체를 만든 과정을 밝혀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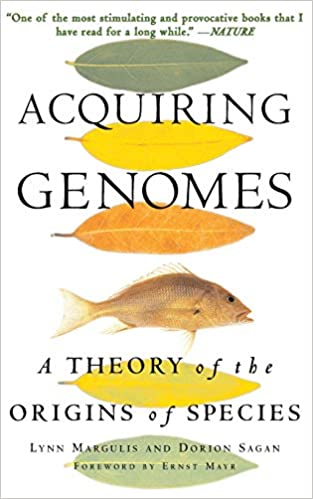
이 이론은 처음에는 이단시되었으나 닉 레인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생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 린 마굴리스는 그녀의 책 <게놈을 획득하다(Acquiring Genomes)>에서 영양분을 산소호흡을 통해 태우는 기능을 관장하는 미토콘드리아와 광합성 기능을 가진 엔진인 엽록체가 공생(symbiosis)의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이를 처음 발표했던 때보다 더 정밀하게 해부해나간다.
지구생명체는 생존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공생의 총체적 이음새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그 생명체 존속의 기본토대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지구의 생명공동체적 성격을 부각시킨 러브럭(J.E. Lovelock)의 “가이아(Gaia)” 개념에 린 마굴리스가 살아생전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것은 당연했다. 러브럭이 일찍이 대기시스템의 변화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 가졌던 우려는 오늘날 기후위기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 ‘물질대사 균열’의 현실과 ‘생태제국주의’
지구라는 생명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존재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순환체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로막히면 “물질대사의 균열(metabolic rift)”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다. 오늘날 우리의 생산시스템에서 폐기물 처리 하나만 봐도 지구 생명공동체의 자율체계인 물질대사과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지는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생명 그물망 속의 자본주의(Capitalism in the Web of Life)>에서 제이슨 무어가 주목한 “세계 생태체제(World-Ecology)”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이 쉽사리 저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본축적의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는 인류세라는 말보다 “자본세(Capitolocene)”라는 말로 이를 표현해내고 있다.
“자본세”의 작동방식은 생태 마르크스주의자 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uy Foster)가 꾸준히 주목해온 ‘자연에 대한 약탈(robbery of nature)’이며 이는 ‘저렴한 자연(cheap nature)’을 독점하고 이를 ‘저렴한 노동(cheap labor)’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구조화시키기 마련이다.
비서구지역에 대한 식민화와 그 지역 원주민들의 노예노동을 강요한 제국주의는 바로 이 시스템의 결정판이며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사지리학자 알프레드 크로스비(Alfred Crosby)는 그래서 이를 “생태 제국주의(Ecological Imperialism)”로 명명하기조차 한다.

- “기후정의”의 목소리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전지구적 위기인 기후위기는 그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 탄소배출의 압도적 책임이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서구제국에게 있으며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각국 내부의 대자본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책임의 차등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부담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여기서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자본축적의 기반이 자연의 유린과 노동의 약탈이라는 구조이며 이것이 기후위기를 발생시키고 있고 인류의 생명을 긴급하게 위협하고 있다면, 이는 은폐된 구조적 대량학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범죄적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력하고 기후정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중대한 윤리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그린 뉴딜”조차도 일자리 창출을 미끼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 신자유주의적 발전론이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들어온다. “윤리적 성장”이라는 생태주의적 관점이 부재하면 자연의 생명이 가진 기본원리인 재생과 순환체제를 회복하는 작업은 요원해진다. 그리고 그 고통과 부담은 고스란히 불평등 구조와 하나가 되어 기후위기 취약군의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폭염노동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후위기가 가져오고 있는 “물질대사과정의 균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토대의 전면적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래세대의 권리인 환경자본까지 기성세대는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약탈해서 쓰고 있는 지경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기후채무(climate debt)”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전정책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 선언은 있으나 탈탄소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기획”은 한국정치의 중심 화두가 여전히 아니다.
- 우리의 미래학
기후위기는 이를 막아내기 위한 기술적 진화에도 기대를 걸어야 하겠지만, 우리 사회전체의 전면적 혁신과 그 과정에서 이행경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철학과 정책이 절실하다. 아니면 자칫 이 역시도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매몰되어 한계에 이른 성장전략을 녹색으로 포장하고 불평등한 구조를 바꿀 생각은 먹지 못하게 되고 만다. 더욱이 탄소지배 사회에서 산소대신 탄소호흡의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역(亦) 세포혁명’은 전혀 꿈꿀 수 없으니 인간의 실존적 위기는 더욱 치명적이다.

다르게 살아가는 가치혁명이 꾸준히 설파되고 그에 따른 윤리적 선택과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생산, 유통, 폐기의 과정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유네스코 미래전망 사무국장을 지낸 프랑스의 미래철학자 제롬 뱅대 (Jérôme Bindé)가 엮은 《가치는 어디로 가는가?(Où vont les valeurs?)》에서 그는“가치와 윤리에 대한 무관심”을 탄식하고 있다. 효율을 앞세우는 현실이 파묻어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생명선이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해서 미래의 지질학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발견하는 현재의 암석은 어떻게 읽혀질까? 인류의 멸종이 아니라 자본세의 멸종이라면 희망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준비하는 주역이 되리라. “기후정의”는 우리의 미래학이다. 이 미래학은 우리에게 “비상행동”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