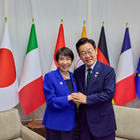‘착한 드라마’ 열풍을 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18일 막을 내렸지만,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여러 숙제를 남겼다.
ENA 수목드라마 ‘우영우’는 지난 6월 첫 방영을 시작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천재적인 두뇌를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법률 회사 생존기를 보여줬다.
◆ 뜨거웠던 ‘우영우 신드롬(유행)’…왜?

매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쏟아진 시청자 후기와 다수의 언론 보도, 시즌2·뮤지컬 제작 계획 등은 ‘우영우’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여성·어린이·탈북자·성소수자 등 여러 사회적 약자의 관점도 잘 보여줬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특히 ‘우영우’는 대중의 ‘공감’을 기반으로 한 서사에 우영우의 성장 과정을 따뜻하게 녹여냈다는 점에서 타 드라마와 차이가 있었다.
드라마 자문을 맡았던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김병건 교수는 “실제 가능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티브(기반)로 법정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우영우라는 캐릭터(인물)가 그 스토리 라인(줄거리)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기존 법정 드라마의 흐름과 정 반대로 민사사건 위주로 만들어져,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소시민들의 공감대가 큰 작품”이라며 “(사건 속에서) 우영우가 착한 선택을 하는 과정을 통해 선함을 인정받고 이기는 이야기들이 색다른 접근이었고, 반전 효과가 크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 ‘우영우는 환상?’…현실과 어떻게 구분 짓나

하지만 ‘우영우’에도 차가운 비판은 있었다. 장애인의 교육 환경, 취업·임금 실태, 사회적 시선 등을 고려하면, ‘우영우’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판타지)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적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드라마엔 환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라마만의 역할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구분 지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현실엔 없지만 드라마처럼 장애인을 돕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으면’과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드라마의 역할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현실을 그린다기보다 판타지를 그리는 게 맞고, (한계가 있어도) 환상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냐’ 논의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런 논의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드라마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메시지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시했다.
◆ ‘우영우’의 선한 영향력, 드라마 끝나도 이어가려면

드라마는 끝이 나고 더 이상 우영우의 성장을 지켜볼 순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영우’와 같은 장애인의 가족, 친구, 이웃, 혹은 장애인 당사자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영우’가 지난 세 달 동안 전한 이야기의 감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는 우영우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공동체’에서 찾으며, 공동체의 역할과 가치를 강조했다.
김 평론가는 집주인 할머니, ‘고래 커플’ 이준호, 정명석·최수연 변호사 등 우영우를 아끼고 지켰던 인물들을 언급하며 “세상은 서로가 관계를 맺고 산다. 서로 간의 측은지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우영우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서로를 차별이나 혐오 없는 시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받아들이면서, 측은지심을 갖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판타지(fantasy) → 환상
(원문) ‘우영우는 판타지?’…현실과 어떻게 구분 짓나 (고쳐 쓴 문장) ‘우영우는 환상?’…현실과 어떻게 구분 짓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