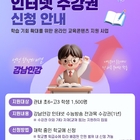규제 완화 도심에 투입 녹지대 보강 문제 최소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도가 설정한 광역녹지축이나 환경부의 광역생태축에 해당하지 않는 그린벨트, 즉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가 전체의 4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양주 연구위원은 24일 ‘광역녹지축 측면에서 바라본 그린벨트 구역의 실효성’ 보고서에서 “현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이 가운데 40% 면적은 그린벨트로서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 중 도가 2002년 실제 녹지상태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녹지 보전을 목표로 설정한 광역녹지축에 해당되지 않는 면적은 전체의 51.5%에 이른다.
환경부가 지난해 국토환경 보전을 내세워 설정한 광역생태축이 아닌 그린벨트도 전체의 50.9%나 차지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가운데 도의 광역녹지축도, 환경부의 광역생태축도 아닌 지역이 39.4%에 달하지만 이 면적을 모두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대신 이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 지역을 개발한 택지개발비를 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녹지가 부족한 곳에 투입해 녹지대를 보강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구 결과 나타난 40%에 이르는 부분은 그린벨트로 규제할 당위성이 약하다”며 “효율적인 녹지 확보가 이뤄진다면 규제 완화나 해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토지 이용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 외곽과 달리 도시 내 녹지가 부족하다”며 “하천 주변과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녹지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장이 밀집한 서남부 지역에는 인공적인 산을 만들 정도의 대대적인 녹지축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경기개발연구원의 이양주 연구위원은 24일 ‘광역녹지축 측면에서 바라본 그린벨트 구역의 실효성’ 보고서에서 “현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이 가운데 40% 면적은 그린벨트로서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 중 도가 2002년 실제 녹지상태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녹지 보전을 목표로 설정한 광역녹지축에 해당되지 않는 면적은 전체의 51.5%에 이른다.
환경부가 지난해 국토환경 보전을 내세워 설정한 광역생태축이 아닌 그린벨트도 전체의 50.9%나 차지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가운데 도의 광역녹지축도, 환경부의 광역생태축도 아닌 지역이 39.4%에 달하지만 이 면적을 모두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대신 이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 지역을 개발한 택지개발비를 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녹지가 부족한 곳에 투입해 녹지대를 보강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구 결과 나타난 40%에 이르는 부분은 그린벨트로 규제할 당위성이 약하다”며 “효율적인 녹지 확보가 이뤄진다면 규제 완화나 해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토지 이용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 외곽과 달리 도시 내 녹지가 부족하다”며 “하천 주변과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녹지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장이 밀집한 서남부 지역에는 인공적인 산을 만들 정도의 대대적인 녹지축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