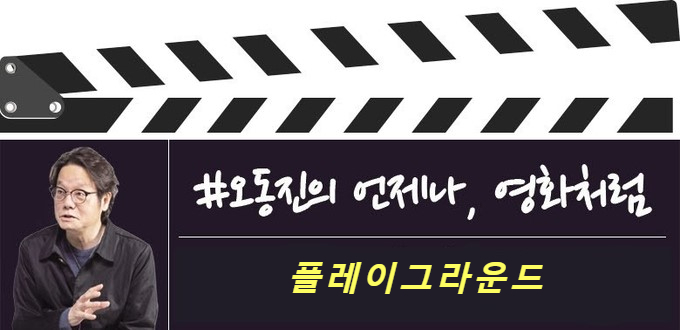
어린이들을 다룬 일종의 아동영화들은, 놀랍게도 상당히 폭력적인 작품들이 많다. 벨기에 산(産) 영화 ‘플레이그라운드’는 특히 그렇다. 70분 남짓한 이 짧은 영화는, 러닝 타임 내내 두 아이가 겪는 학교 폭력의 얘기를 다룬다. 사뭇 끔찍하고, 진실로 걱정되며, 어쩔 수 없이 반성의 기분을 갖게 만든다. 아이들의 문제란 결국 어른들이 만들어 냈거나 방치한 문제이고 따라서 어른들이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플레이그라운드’를 조금만 보다 보면 촬영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신예 감독 로라 완델의 카메라는 아이들의 머리 위 이상을 웬만해서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극중 성인 캐릭터는 대체로 웨스트 언더 숏(waist under shot)이다. 성인들은 도무지 허리 위가 나오지 않는다.

인물들을 롱 숏이나 풀 숏으로 담을 때도 성인 캐릭터는 포커스 아웃시켜서 흐리게 나오게 한다. 그들의 얼굴과 표정이 드러나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대사는 보이스 오프(voice off)로 처리되는 식이다. 목소리만 나온다는 얘기다. 성인 캐릭터의 얼굴이 나오는 것은 이들이 주인공 아이들에게 몸을 낮춰 대화를 할 때 만이다. 아빠가 등굣길에 아이와 눈을 맞출 때, 혹은 유일하게 주인공 노라를 이해해 주는 여자 선생님이 아이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카메라는 그제야 온전히 투 쇼트로 인물을 잡는다.
로라 완델은 철저히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담아내겠다는 의도와 의지로 카메라 눈높이를 일관되게 낮춰 잡는다. 그 형식이 독특한 작품이다. 그건 마치 일본 고전영화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의 카메라를 일명 ‘다다미 쇼트’라 해서, 다다미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담을 요량으로 카메라 시선을 평상(平床) 높이로 낮춘 것과 같은 이치이다. 로라 완델의 카메라 워킹은 오즈 야스지로에서 배워 온 듯한 인상을 준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운동장이다. 운동장은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각적이고 다층적으로 쓰인다.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이 기본 개념이지만, 게임이 규칙이 적용되는 곳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흔히들 선거 과정이나 정치 지형도를 얘기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그 같은 맥락이다. 운동장은 평평하고 수평적이며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것이 됐든, 어른들의 것이 됐든 운동장이 본연의 운동장이지 않을 때가 많다.

노라(마야 반데베크)와 아벨(군터 뒤레)은 전학을 왔다. 7살 노라는 오빠와 떨어지기를 싫어한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게 무섭기 때문이다. 노라는 첫 등굣길부터 오빠의 품에서 그리고 아빠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오빠 아벨은 아벨대로 문제가 많다. 아벨은 첫날부터 전학생 군기를 잡으려는 학교 일진 아이들 때문에 이러저리 차이고 쥐어 맞기 시작한다. 근데 그 심각성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한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화장실 변기에 얼굴이 처박히기까지 한다. 이쯤 되면 거의 조폭 수준이다.
처음에 노라는 그 사실을 학교 선생님에게 알린다. 그러나 정작 오빠 아벨은 자신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여동생이 선생님한테 그걸 이르면 이를수록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동생 노라도 점점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오빠를 위하는 길일 수 있다는, 그 복잡미묘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국 노라는 아빠에게도 오빠가 당하는 따돌림 폭력에 대해 고해바친다. 학교는 한바탕 시끄러워진다. 하지만 예상대로 오빠 아벨은 동생 노라를 따돌리기 시작한다. 아벨 본인도 이미 폭력의 세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그건 자신이 당하지 않기 위해 그 패거리에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그건 또 스스로도 폭력을 사용하는 쪽의 편에 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이들 나름의 줄서기인 셈이지만 이제 노라는 오빠 아벨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는 처지가 됐다. 오빠와 여동생, 아이 둘은 이 폭력의 순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까. 둘은 온전히 폭력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보통은 아동의 세계, 초등학생의 세계가 가장 원칙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데다 순수한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반대다. 어쩌면 가장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세계이다. 인간은 아주 일찍부터 인생과 세상, 사람 간 관계의 부당함, 부조리함을 배운다. 어쩌면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릴 때 배웠던 그 불협화(不協化)에 순응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순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의 부조리함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서 오히려 둔화되는 것이지, 강화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어릴 때의 순수함을 잃은 결과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원래 순수하지 않았던 세상을 그나마 이성적 논리를 구축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순수의 원형을 가까스로 개념화시킨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 유치원에 있다’ 혹은 ‘초등학교에 있다’란 말은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야 하는 말이다. 우리는 부조리(不條理)를 어릴 적부터 배웠고, 오히려 그것을 조리(條理)로 바꾸는 중이다. 그 과정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그것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기묘한 것은 완벽하게 성공하기도 아주 실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선과 악,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매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아주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 모든 판가름이 사실은 매우 어릴 때에, 진작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이지만 이해도의 측면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만큼 오묘한 진실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캐나다 거장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가 만든 2007년작 ‘폭력의 역사’나 2015년작 ‘이스턴 프라미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둘 다 인간 폭력의 실체에 대해 해부하고 있는 작품인데 ‘플레이그라운드’가 가히 그에 못지않다. 인간 폭력의 기원이 아동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 혹은 아이들 학교폭력의 문제를 어떻게든 교화해 보자, 뭐 그런 캠페인성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실체와 본질에 대해 깨닫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걸작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의 아이들이 누구 하나를 따돌리기 시작하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 일들이 일어 날 수 있는가. 비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영화가 주는 비현실성의 현실성, 현실성의 비현실성인 셈이다.

아이 둘, 노라와 아벨 역의 두 어린이 배우의 연기가 혀를 내두르게 한다. 노라는 아벨이 사고를 쳤다는 얘기를 담임선생에게 듣고는 (말 그대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책상에 앉아 있는 노라의 얼굴에 맞추느라 한껏 다리를 낮춘 상태다. 여자 담임선생이 그런 아이에게 몸을 숙였다가 아예 옆자리에 앉는다. 카메라가 오랜만에 성인의 얼굴에 포커스를 맞춘다. 선생이 말한다. “아이들은 보통 다 그렇게 싸우고 그래.” 그러자 노라가 말한다. “이건 그냥 싸움이 아녜요.” 맞다. 아이들의 싸움도 그냥 싸움이 아니다. 거기에도 권력과 헤게모니 쟁탈이라는 본연의 속성이 끼어들어 있다.
여선생의 얼굴에 이해한다는 표정이 실린다. 카메라가 거의 처음으로 어른과 아이를 동등한 구도로 잡아낸다. 그냥 싸움이 아닌 것이다. 인간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그 같은 부조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까먹었거나 까먹은 체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부당함과 세상의 폭력은 그 해결 방법이 의외로 쉬울 수가 있다. 어릴 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선생이나 아빠한테 이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까, 오빠나 형 말대로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나마 평화를 찾았던 것일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가 틀리고 지금이 맞거나. 그 오묘한 정치를 기억해 내는 것, 그리고 복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것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