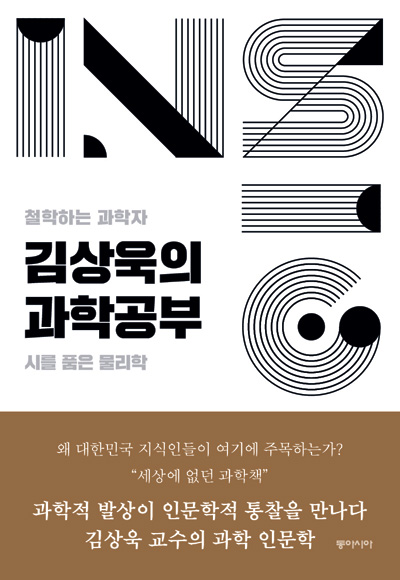
철학자 들뢰즈는 “철학은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화(神話)와 공포(恐怖)라는 것.
같은 맥락에서 신화와 공포를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과학으로 생각하는 것’은 만들어진 신화와 공포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철학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인문학 중심의 태도를 가졌던 우리에게 생소한 상황이 되기 일쑤였다. 당장 우리가 직면했던 천안함, 광우병,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원자력발전소, 4대강 등의 이슈들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분석에 의한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였고, 과학적 소양 부족이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됐다.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이자 아태이론물리연구소 과학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김상욱은 과학 지식 자체를 심층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교과서 속 공식과 법칙들을 외우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이라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과학적 사고방식은 곧 철학이고 인문학이며 세상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밝힌다.
그가 쓴 ‘김상욱의 과학공부’는 과학에서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1장 ‘과학으로 낯설게 하기’에서는 세상을 낯설게 보고 다르게 보는 방법을 훈련하며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장 ‘대한민국 방정식’에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신화와 공포를 파헤친다. ‘비과학적인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밝힌 저자는 과학이 이런 비인간적인 사실들에 눈감는다면 과학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고 전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과학자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다루며, 마지막 4장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류의 본질적 질문에 우주의 논리로 답한다.
먼 과거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자신의 앞에 놓인 관계만을 생각하며 법칙에 따라 나아가는 우주와 같이 사람도 눈앞의 일을 향해 정확히 한 걸음 내디디며 우주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한다.
끝으로 저자는 “과학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말이 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경화기자 mk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