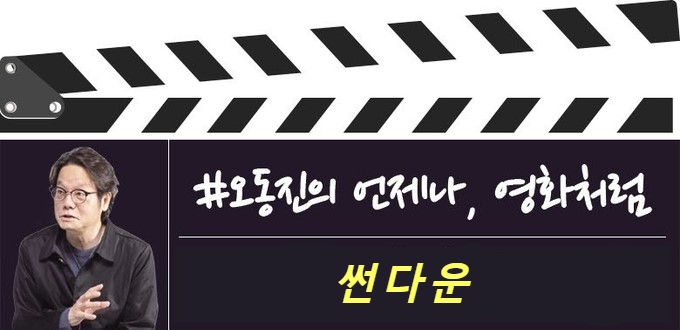
인생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제목처럼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퍼센트의 여자를 만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람들은 100퍼센트 만족할 수 있는 상대나 인생의 그 무엇을 누리지 못한다. 그건 자의식 과잉 때문인데, 100퍼센트의 여자와 100퍼센트의 남자는 자신들이 100퍼센트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헤어진다. 그리고 다시 만나지 못한다. 그런 것이다 인생은.
멕시코의 기이한 감독(멕시코에는 이상한 상상력의 감독이 많다. 길예르모 델 토로 같은. 그런 감독들은 대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받는다) 미셀 프랑코는 이번에도 어두운 인생의 저편 같은 작품을 내놨다.
영화 ‘썬다운’은 제목처럼 일몰, 해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의 인생은 왜 저무는가’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화는 끝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영화 내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질인다. 스멀스멀 짜증을 나게 만들며, 분노를 유발한다.
‘주인공 남자 저거,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속 시원하게 대답도 안 하는 거야’ 하는 심정이 들게 만든다. 그리고 영화가 거의 끝나갈 때쯤 모든 이유를 알게 된다. 그 이유 하나로 스토리를 몰고 가는 미셸 프랑코의 이야기 솜씨가 꽤 괜찮다. 이런 드라마를 미스터리 기법으로 풀어가는 건 순전히 멕시코식 사고(思考) 때문 일 것이다.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멕시코에서는 일상에서 총격이 벌어지고, 살인과 암살, 납치가 이뤄진다.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이다. 그러니 모든 얘기는 미스터리 구조로 짜는 게 맞다.

영화가 시작되면 어딘가의 초호화 리조트에서 휴양 생활을 하는 중년 남녀와 청년급의 남녀가 보인다. 가족 같지만 완전체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아이 둘은 여자를 엄마(샬롯 갱스부르)로 부르고 남자를 삼촌(팀 로스)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엄마와 삼촌의 관계가 범상치는 않다. 그냥 이들이 노는 게 너무 사치스러워서 심상치가 않기도 하다.
그러던 중 여자에게 전화가 오고 여자의 엄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다. 그렇다면 삼촌이라는 남자에게도 엄마가 될 텐데 남자는 여자에 비해 그다지 슬픈 얼굴이 아니다. 급기야 남자는 여권을 잃어버렸다며 여자와 아이들을 집(런던)으로 돌려보내고 혼자서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되 이번엔 완전히 싸구려 모텔 앞 해안으로 간다. 알고 보니 여기는 멕시코 아카풀코였고 좀 전까지 최고급 호텔에 머물던 이 닐이라는 남자, 뭔가 뜻한 바가 있는지 칼레티야 해변으로 온다. 아니 아예 뜻한 바가 없어서 온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해변가 싸구려 상점에서 일하는 멕시코 여자를 만나 몸을 섞고, 같이 지내기 시작한다. 닐은 여자를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해 준다. 멕시코 여자도 그런 닐이 좋다.
그러나 정작 런던에서는 난리가 났다. 엄마의 장례식을 홀로 치러야 했던 여동생 앨리스는 아카풀코로 다시 돌아와 이해할 수 없는 오빠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알고 보니 이 남매, 영국에서 양돈과 도축 사업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집안의 자식들이다. 이때부터 영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틀고는 보는 사람들의 생각일랑 아랑곳없이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

미셸 프랑코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래도 된다고 받아들일 때 삶과 세상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늘 자신의 영화로 증명하려 애쓴다. 전작 ‘크로닉’에서 호스피스 간호사(팀 로스)가 사람들을 안락사시키거나 죽어가는 노인에게 포르노를 보여 주는 것도 고통보다는 그게 낫다, 어쩌면 그게 예수의 행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닉’의 마지막 장면은 꽤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끝맺을 수 있느냐는 ‘원망(?)’들이 적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결말 아니면 도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끝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만든다.
또 다른 그의 전작 ‘에이프릴의 딸’은 딸의 남자를 차지하려는 엄마(엠마 수아레즈)의 이야기다. 현대사회의 욕망이 모성조차 얼마만큼 변질시켰는지를 보여 주며 도무지 이야기의 결론을 짐작할 수 없게 한다.
미셸 프랑코는 그런 감독이다. 세상은 이미 변이 됐고 정상인 것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정상이 아닌 사회에서 과거의 관습대로 정상처럼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썬다운’의 주인공 닐도 무슨 일 때문인지 삶에 변이가 왔다. 그는 앞으로 다르게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애쓴다.

닐은 주변 사람들의 숱한 질문에 대해 말을 할 듯 말 듯 결국 입을 다물고는 기묘한 표정만을 짓는다. 그 같은 표정 연기는 순전히 노련한 삶의 경력을 지닌 배우 팀 로스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혹은 설명할 게 너무 많을 때 역설적으로 실어증에 걸린다. 실어증에 준할 만큼 입을 다물게 된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왜 닐의 대사가 그렇게나 없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영화에서 닐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멕시코 여성의 풍만한 육체를 안고 있을 때도 그는 밀어조차 속삭이지 않는다. 둘의 대화에서 가장 진지하고 그나마 길었던 것은 멕시코 여자가 닐에게 런던에 아내가 있는지, 애들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이다.
닐은 자신은 아내가 없고 아이들은 오직 조카 둘 뿐이라고 말한다. 멕시코 여자는 살짝 ‘이런 남자가 왜 여기서 나를?’하는 표정이 되지만 사실 상관이 없다. 매일같이 죽음이 벌어지는 멕시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사랑을 나누고,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하며, 지금 같이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여자는 그렇게 남자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왠지 둘의 관계의 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불길하다. 닐의 삶이 불길하고, 멕시코 아카풀코 해변이 불길하며, 세상이 불길하게 느껴진다. 우리의 삶 모두가 불안하고 불길하게 느껴진다. 아니나 다를까 닐은 자꾸 돼지의 환상을 보기 시작한다. 그것도 도축당한 돼지를.

이번 영화 ‘썬다운’은 전작들에 비하면 이야기의 결말을 비교적 쉽게 짐작하게 만든다. ‘주인공 닐의 선택은 저것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사람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엄해야 한다. 그런데 사는 게 너무 바쁘면 종종 그것을 까먹게 된다. 그걸 잊지 말라고 깨우쳐 주는 영화다. ‘썬다운’은 인생엔 꼭 해가 질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작품이다. 인생에서 화양연화는 짧다. 화양연화 이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해는 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늘. 그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