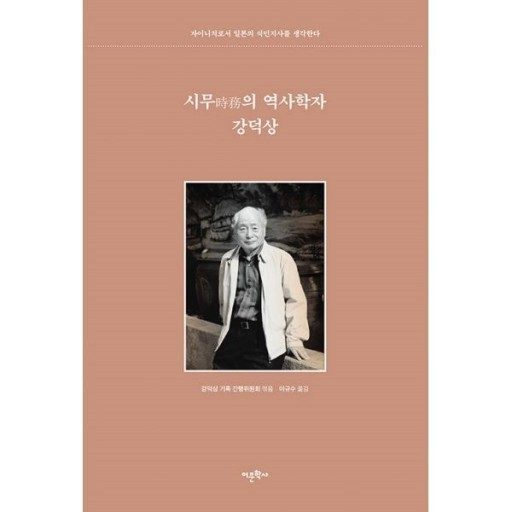
-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연구
“계엄령으로 군대가 조선인을 죽이기 시작하지요. 동시에 경찰은 조선인 폭동을 선전합니다. 이를 본 민중은 자신들도 나라를 위한다며 재향 군인, 청년단, 소방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자경단을 조직합니다. 그들은 조선인 사냥에 나서서 조선인이 판명되면 죽였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과 관련한 재일 사학자 강덕상(姜德相)의 진술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단지 보통의 일본인들이 저지른 학살이라기보다는 이 학살에는 국가가 개입, 주도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계엄령은 내란 또는 전쟁 때 발령됩니다. 그런데 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해 계엄령이 발령되었을까?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자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질문을 실마리로 해서 강덕상은 1975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을 펴낸다. 국가에 의한 학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행되었는지를 사료(史料)와 증언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그는 이후 『여운형 평전』을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무려 17년간 네 권까지 마무리해서 출간하게 된다. ‘강덕상’이라는 이름이 국내까지 뚜렷하게 알려진 결정적 계기였다. 이 평전은 여운형에 대해서는 독보적이고 기념비적인 저작이다. 여운형 평전 1권은 “조선독립운동”, 2권은 “상해임시정부”, 3권은 “중국혁명의 벗이 되어” 4권은 “일제 말기 암흑시대의 불꽃이 되어”로 각기 그 주제가 정리되어 있으며, 1권과 2권(축약)은 국내에서 번역되어 있다.
로버트 스칼라피노(Robert Scalapino) 교수와 함께 『한국공산주의 운동사(Communisim in Korea)』를 냈던 재미 정치학자 이정식은 여운형 평전 작업을 하다가 강덕상의 작업을 보고는 기가 질린다. “『여운형 평전』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가 인용한 자료의 방대함과 서술의 세밀함을 보고 나는 과연 여운형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기까지 했는데 만용을 발휘하여 집필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그의 책 『여운형』의 서문에 적어놓는다. 그 역시도 강덕상처럼 항일투쟁 지도자 가운데 여운형을 제일 좋아했던 것이 저술의 동기였다. 이정식의 『여운형』도 강덕상의 저작 못지않게 역작(力作)이다.
이정식은 1931년생, 강덕상은 1932년으로 두 사람 모두 일제 황민화 정책의 과정에서 성장했고 그걸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거친 재외(在外) 지식인들이다. 두 분 모두 이제는 고인(故人)이다. 이정식은 여운형이 “세계무대에서 우리 겨레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고 못 박는다. 이정식, 강덕상 모두 짚고 있듯이 여운형은 레닌, 트로츠키, 쑨원(孫文), 장제스(蔣介石), 마오쩌뚱(毛澤東), 일본 우익의 거두 오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베트남의 호치민(胡志明) 등 세계사에 불멸의 이름을 남긴 이들과 교유하고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니 그 인물의 크기를 능히 가늠할 수 있다.
우익인 오오카와 슈메이와의 친교는 의외라고 여길 수 있으나 그는 일본 군부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했고 장제스와의 전쟁도 중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녔다. 일본 군부도 그를 쉽게 대하지 못했고 그런 오오카와 슈메이와의 교유를 통해 여운형은 자신의 행동반경을 넓혀나갔으니 독립운동을 대하는 사고의 규모가 남달랐다. 일본 제국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3.1 운동 또는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된 여러 요인 가운데 여운형이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면서 세계적 발언의 토대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여운형 연구와 독립운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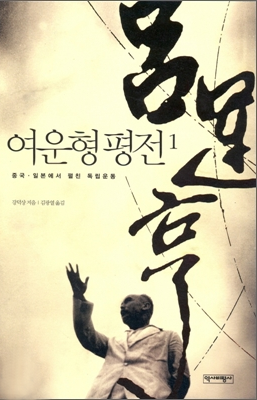
하여 강덕상의 『여운형 평전』은 그의 말대로 “한 인물의 생애를 실증적으로 복원하고, 한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된다. 그는 이 책을 “평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독립운동사론”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랬다. 이어 그는 “앞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민족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자산”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강덕상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오래 전 일본 동경 진보초(神保町) 고서점에서 우연히 박은식(朴殷植)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일본어판을 발견했고 그 역자가 강덕상이라는 사실이 시발점이었다. 그는 이 책을 1972년 번역한다. 강덕상은 평생을 일본 제국주의의 죄악을 폭로하고 조선 독립투쟁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바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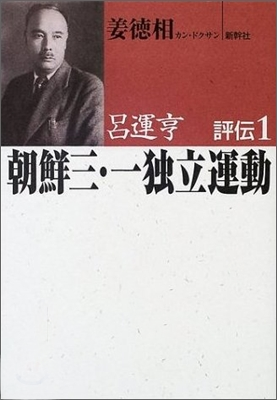
그런 각도에서 다시 관동대지진에 대한 그의 분석으로 돌아가 보자. 이 대목은 그의 역사관이 형성된 과정을 구술로 기록한 『시무(時務)의 역사학자 강덕상』에 적힌 내용이다. 이 책은 일본에 있는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가 엮은 것으로 여기서 “시무(時務)”란 “시대의 의무”, 다시 말해서 “지금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강덕상이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라는 매우 중요한 저작을 낸 박경식(朴慶植)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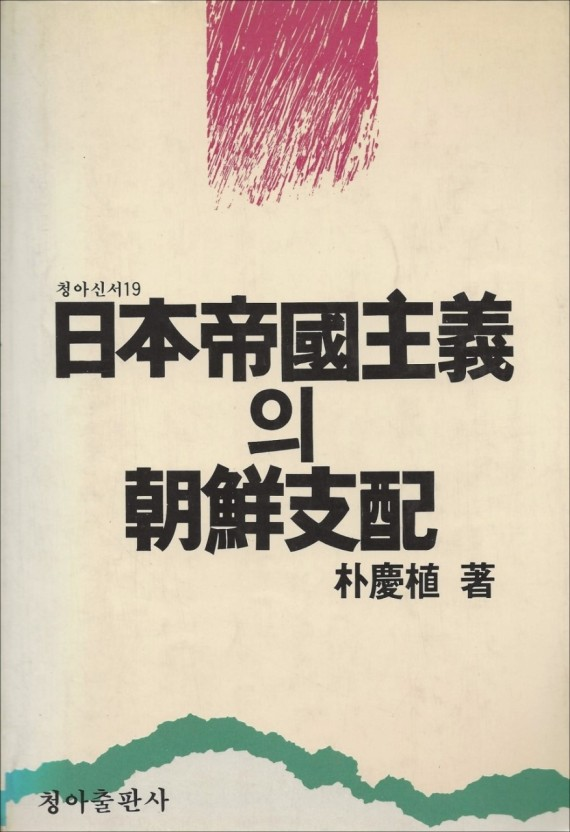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서 강덕상은 왜 조선인을 죽여도 된다고 여겼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계엄령이 내려진 역사적 경위를 짚어나간다.
“학살 사건의 전제로서, 30년에 걸친 전사(前史), 즉 갑오 농민군과의 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강점에 반대하여 전국을 선혈로 물들였던 7년에 걸친 의병 전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이런 전쟁을 체험하면서 조선에 대한 ‘적시(敵視) 사상(적/敵으로 대하는 생각)’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분석이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이후 총독정치의 중심을 헌병 무단정치(武斷政治)로 밀고 나간 까닭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강덕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1910년 조선 총독부가 생깁니다. 총독은 현역 육해군 대장이 아니면 임명되지 못하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 전쟁을 겪으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통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헌병정치입니다.”
그는 총독부가 “활화산 위에 서 있는 권력”이라면서 “조선 총독부는 이천만 조선인의 원망의 눈길에 휩싸여 있어 고슴도치처럼 무장할 수 밖에 없는 권력”이었다며 이런 전제 아래 3.1 운동도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현지 일본 육군은 3.1 운동에서 진압한 조선인과 대결한 매일매일의 전과를 육군성에 보고했습니다. 평남 맹산에서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100명의 시위대 중에 67명이 죽었고 사용된 탄환은 76발이었습니다. 헌병들이 모두 백발백중 사격술로 전원 몰살시키겠다는 적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3·1 운동이 비폭력 평화운동이라는 점만 강조하려 했지, 이 참담한 학살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선인 학살이 당연했으니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강덕상의 말대로 “우연히 일어난 조선민족의 비극이 아니라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전쟁의 연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살”이었던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동맹과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이 역사를 망각한 채 사고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날카롭게 유념해야 할 일이다. 갑오농민전쟁은 청일전쟁과 직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조선농민 학살은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의 청일전쟁 연구에서 단연 뛰어난 저작으로는 후지무라 미치오(藤村道生)의 것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청일전쟁이 조선에서 반(反)침략, 반(反)봉건의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출병, 탄압으로부터 발생하고 대만의 항일의병투쟁의 진압으로 종결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이 국면은 전쟁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정리한다. 그리고 일본은 이 사실을 민중의 눈으로부터 감추었다며, 청일전쟁은 조선민중에게는 “반(反)혁명 전쟁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라고 규정한다.
이러니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총독부 정치를 밀고 나갈 때 원한에 찬 조선민중들의 저항과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강덕상의 말대로 조선천지가 활화산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항의 역사, 탄압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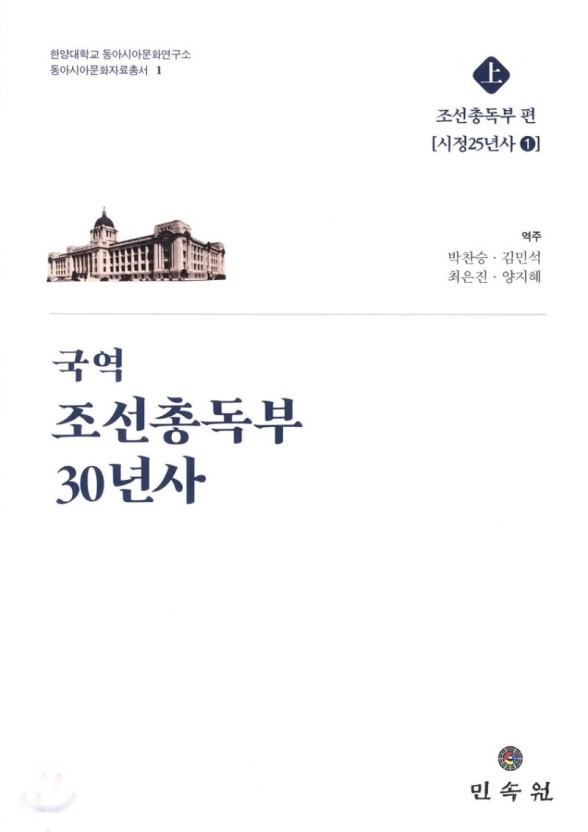
박찬승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6년간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조선총독부 30년사(3권)』는 바로 그런 정세의 요체를 그대로 보여준다. 1935년에 발간된 이 책의 서문에 당시 정무총감(총독의 최상위 보좌역)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淸德)가 이렇게 말한다. “한국병합 당시의 조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조선을 보고 그 진보가 현저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어지는 서설(序說)에는 이런 대목들이 담겨 있다.
“일본은 한반도가 여러 민족에게 위협을 당하면 군사를 보내 한편으로는 그 위급함을 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위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총독정치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인민들 가운데서는 아직 일본의 성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배일(排日)의 기세에서 벗어나지 못해 통감정치에 불만을 품은 무리가 적지 않았으며 많은 단체를 만들어 여러 가지 책동을 하였다”고 힐난하고 있다. 그래서 “비도(匪徒), 초적(草賊/항일의병)들은 완전히 진압되지 못”해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민중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1912년 태형령(笞刑令)이 공포된다. 이를 가장 먼저 주목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역사학자는 중국사를 공부하고 있던 강덕상에게 조선사를 공부하라고 충격적 자극을 준 야마베 겐타로(山邊建太郞)였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통치 해부』에서 “수형자를 형판에 붙들어 매고 입을 헝겊으로 틀어막고 노출된 둔부를 때리는 태형이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다면서 “매우 잔혹한 형벌이자 간단히 시행될 수 있기에 남용되었다”고 적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놈들은 때려야 되'라는 말들이 돌아다닌 이유가 달리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거론했던 『조선총독부 30년사』에 바로 이 태형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태형은 직접 육체에 고통을 주는 체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만적 형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형벌조직의 요점은 오로지 국가의 형편을 감안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을 발견함에 있고 또 그 집행방법이 적절했으며 그 효과가 컸던 조선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선 태형령’을 발포했다. 이는 조선의 실정에 잘 적응하여 그 효과는 상당히 양호하였다.”
박경식은 이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행정, 사법에서 특권을 가진 헌병제도 아래 헌병이 즉결처분권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태형은 다반사가 되었고 그 포학은 날로 더했다며 1919년 3.1 운동의 여파로 1920년에 가서야 폐기되었다고 한다. 합병하면서 조선왕조의 형법은 없애고 유독 태형만 더 잔혹한 방식으로 남겨둔 것은 일제의 악랄한 통치 수법이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태형의 구체적 실상은 다음과 같다.
“태(苔)는 소의 음경을 사용하고, 앞에 납을 붙인 것으로 때리면 살에 움푹 패여 들어가 출혈했다. 물에 적신 베를 입에 물게 해서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했고 이 형벌의 과정에서 사망자, 불구자 등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다. 나무로 만든 매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박경식 그리고 야마베 겐타로와 같은 역사가들의 관심과 연구는 오랫동안 조선인임을 감추고 일본인으로 지내왔던 강덕상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황국(皇國)소년으로 성장해온 그의 역사의식을 뒤흔든다. 시나노 사토루(神農智)라는 창씨명을 가지고 있던 그는 어느 날, 와세다 대학원 중국연구회에서 마침내 “내 본명은 강덕상이다!”라고 선언한다. 이 사건이 실마리가 되면서 그의 조선사 연구는 시작되고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조선총독부 관리들의 모임인 “우방협회(友邦協會)”와의 만남이었다.
-우방협회 그리고 조선사 연구

‘중국 연구회’에 함께 했던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가 졸업논문으로 3·1 운동에 대해 쓰려고 자료찾기로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真六郞)가 회장으로 있는 우방협회에서 자료를 발굴했고 이를 계기로 『조선근대사료연구회』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미야타 세츠코는 강덕상의 조선인 선언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으로 번역된 조선총독부 관리 육성 증언의 서문 해설에 담긴 내용이다.
“강덕상의 이 조선인 선언은 중국 연구회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각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나는 조선 근대사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무모하게도 졸업논문의 테마로 ‘3.1 운동’을 선택해버렸다.”
사실 이 우방협회와 젊은 학생들과의 만남은 미묘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 관리를 했던 이들과 일본의 조선 식민지에 대한 비판적 연구자들의 모임은 어긋날 수 있었으나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육성 증언을 담아내는 과정은 기록이 없는 사실을 기록으로 응고시켜 남기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서 방대한 사료가 만들어지고 편집되어 일본에서의 조선근대사 연구의 초석을 세웠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본의 역사적 죄악을 들추는 일이 빨갱이처럼 취급받았고 일본에서는 감추기 바빴다며, 조선 근대사의 정체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저는 이를 재일사학(在日史學)이라고 부릅니다. 재일문학도 있지만 재일사학이 일본인들의 허점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다루지 않는 것, 일본인이 피하고 싶은 영역을 일본 역사학계에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역사가이며 작가로 재일 지식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김달수,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연행 연구, 광대토왕비를 연구한 이진희, 조선의 근대사와 사상사를 파고 든 강재언, 관동대지진과 김옥균 연구에 몰두한 금병동, 『청일전쟁과 조선』이라는 역작을 남긴 박종근 등 재일사학자들의 공헌은 지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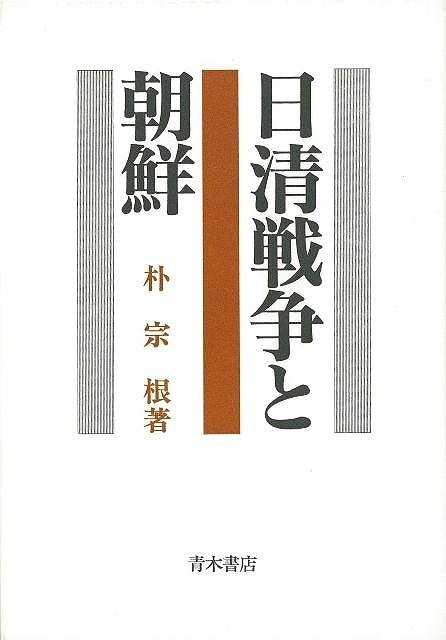
“그 시절 조선의 근대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재일 조선인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 연구는 일본에 있던 자이니치(재일) 역사학자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차별을 이겨낸 피맺힌 증언이다. 지금 우리는 이들의 유산을 어떻게 받아 안고 있을까? 한일관계는 군사동맹이라는 위험한 괴물이 되려고 하는 참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