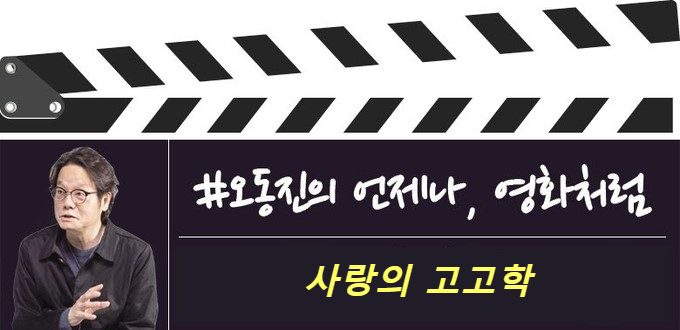
사랑과 고고학은 멀리 있는 듯 사실은 가깝게 있는 개념이다. 고고학하면 카르멘 로르바흐가 쓴 ‘나스카 유적의 비밀’이나 아놀드 C.브랙만의 ‘니네베 발굴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페루 나스카 평원에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봐야만 전체가 보이는 물경 45m 안팎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고고학 하면 이런 걸 발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혹은 앗시리아의 옛 수도인 니네베에 묻혀 있는 4000년 전, B.C.2000년 전의 유적들을 발굴하는 것이거나.
고고학자가 되는 것은 나름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세계 오지를 떠돌며 인류사의 흔적을 뒤좇고 온갖 모험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다.
시몬 스톤의 2021년 넷플릭스 영화 ‘더 디그’의 주인공 바질 브라운(랄프 파인즈)처럼 고고학자는 끊임없이 파고 또 파고, 쓸고 닦고, 비질과 세척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고고학은 생각지도 못한 예상 외의 ‘막’노동을 요구하며 그러면서도 지질학 같은 별도 학문을 병행시킨다. 고고학자가 된다는 것은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도무지 스윗하지가 않다. 그러기는커녕 이만저만 고생을 시킨다는 면에서 고고학과 진배없다. 사랑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 그 진실의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게 만든다. 그래서 간신히 뭔가 하나를 발굴했다고 생각하면 이번엔 그것의 겉면을 솔로 빗겨내고 다듬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히기 십상이다. 아니 애초부터 수백 수천 년을 땅의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빛을 받은 유적, 곧 사랑의 본질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가치가 떨어진다. 고고학의 유적이 그렇고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다. 어찌 보면 그냥 파묻혀 있는 게 나은 셈이다.
주인공 영실(옥자연)은 고고학도이다. 순전히 밥벌이를 위해 고등학교 체험 실습 특강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그녀는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사명감만 있고 미래 비전은 없으며 절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가능하면 고고학을 전공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영실은 지금 막 한 남자와의 기이한 동거를 끝내려고 한다. 학교 선배인 듯 보이는 남자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적 관계와 남녀 간 육체적, 정신적 관계가 혼재된 사이의 상대이다.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지쳐 있는 상태이고, 남자에게 영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 줘’이다. 아니면 언제쯤 나갈 거냐고 묻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셋돈도 자신이 마련했으니, 상대가 나가야 하는데 이 남자 도통 급할 게 없는 태도이다. ‘아 나간다니까’가 그의 말버릇이다.

그런 남자와 좁은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샤워도 번갈아 하며, 빨래도 같이해 개어 주기까지 하면서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혹은 연인처럼 살아가지만, 영실의 일상은 늘 살얼음판이다. 뭔가에 집중하고 자신을 정비해 나갈 수가 없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됐다기 보다는 사람을 만나 지내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사랑은 영원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이 지경이 됐다.
그런 영실은 또 한 번의 연애를 준비한다. 음악을 하는(아마도 방송음악이나 영화음악을 하는 것 같은) 인식(기윤)이라는 남자이다. 인식은 영실에게 어떠한 얘기를 듣더라도 그녀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그녀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말한다. 영실은 반신반의 하지만, 연애와 사랑이 지니고 있는 선의를 믿고 과거의 남자, 과거의 관계에 대해 알려 준다.
사람이 사는 건 이렇게 저렇게 ‘스몰 월드’인지라 둘이 연결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 인식도 영실이 학교 시절 누구와 어떻게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만들며 살았는지 듣게 된다. 영실의 남자관계가 자유분방했는지 방종했는지 아니면 문란했는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법.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런 감정을 교류하거나 그래서 때론 가벼운 육체관계를 맺거나 잠깐이라도 사귀게 된다. 사람들은 스스로들 얘기를 안 하고, 감춰두고, ‘발굴되지 않게끔’ 땅속 깊이 묻어 둬서 그렇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한다.

인식은 영실을 8년 동안 쫓아다니며 들들 볶는다. 다른 남자를 입에 올리며 그 남자와 잘 때는 어땠느냐 혹은 그 남자한테도 이랬느냐는 둥 천박하고 상투적인 질문 고문을 퍼부어 댄다. 그러고 나서 미안해하기를 반복하고 또 조금 지나서는 온갖 꼬투리를 잡아 대며 영실을 못살게 군다. 영실은 그런 상황을 견디다 견디다 못해 인식을 떠나지만, 종종 전화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섹스해달라는 남자의 요구까지는 거절하지 못한다. 다시는 안 가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영실은 인식을 완벽하게 떨궈 내는데 늘 실패한다. 그것이 8년이 걸린다.
사랑은 고고학의 비질처럼 오랜 시간 살살 다뤄야 한다. 그래서 얻어 내는 유물은 둘 관계의 사랑이 지닌 본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웬걸 결국 그렇게 어렵게 찾아낸 것은 자기 자신, 곧 자아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애’라는 위대한 진실의 유물이다. 다른 관계들을 일시적이나마 반복적으로 계속 밀어내면서라도, 자신을 온전히 지켜야만 영원한 사랑을 해 낼 수가 있다. 사랑은 남자나 여자 같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이다. 영실이 그걸 깨닫기까지 실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물경 163분 동안 줄곧 목도하게 되는 인식의 광적인 집착, 그 야비한 행태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쪼그라든다. 사랑이 지닌 그 비루함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긋지긋해지는 마음이 된다. 인식 같은 남자를 만나면 후미진 골목길에서 흠씬 패주고 싶지만, 그런 인식의 모습이 우리의 평균치 남성들의 모습과 다름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영화는 그래서 역설적이다. 절망적인데 반대로 어떻게든 자신을 되찾아 가는 영실의 모습,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아를 회복해 가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 밝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실제로 영실이 자립을 시도해 가는 모습은 대체로 밝은 야외이다. 친구나 선배와 카페 테라스 같은 데서 커피를 마시거나 호감을 갖게 된 어떤 남자(이 남자는 발굴 현장의 인부인데 조경 일을 하기도 한다)의 나무 재배장 같은 곳에서 얘기를 나눈다. 인식을 벗어나면 영실의 삶을 비추는 조명은 환해진다.
내가 없는 사랑은 없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상대와의 사랑을 이어 나가기가 힘이 든다. 변하지 않는 사랑도 없다. 내가 변하고 그렇게 변하는 나를 지키면서 변화해 가는 상대를 인정하면, 비교적 지속적인 사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느니 반드시 영원해야 한다느니 하는 강박에서 제일 먼저 벗어 날 수 있어야 한다. 감독 이완민이 남자 인식의 모습을 통해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일 것이다.
사랑은 고고학이다. 끈질기고 인내심이 강한 자, 자기와의 싸움에 능한 자만이 유적, 사랑의 본질을 발굴한다. 감춰진 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