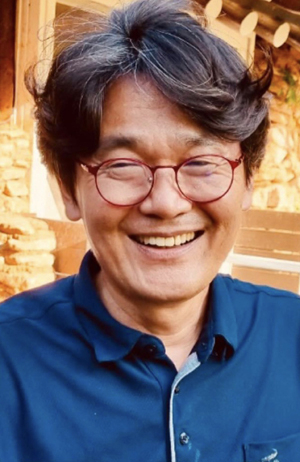
답은 없습니다. 옳음도 그름도 그러합니다. 생각 따라 다르고, 처지 따라 바뀝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반이나 마셔버린 술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절반이나 남은 술병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술병이 ‘벌써’가 되기도 하고 ‘아직’이 되기도 합니다. 말 역시 그러합니다. 뜻을 전하기 위한 게 말이지만, 되려 뜻을 왜곡하는 게 말이기도 합니다. 말이 말을 뒤집고 말이 말을 감춥니다. 뒤집고 감춘 건 말인데, 뒤집히고 멀어지는 건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고 가려 할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출발점은 말입니다. 전쟁과 평화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선전포고든 평화협정이든 말 아닌 게 없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버립니다. 낳은 말도 버린 말도 사람의 것인데, 낳음과 버림의 끝에는 사람은 없고 말만 살아 날뜁니다. 날뛰는 말 뒤로 사람이 숨으면, 말은 흉기가 되고 세상은 난장판이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끝내 담을 수 없습니다. 아낄수록 좋은 게 말입니다. 진심은 말이기보다 침묵에 가깝습니다.
감정에도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끝내 붙잡아야 할 인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놓아야 할 짐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 ‘충만’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행복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 밥상에서 웃음을 찾지만,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쥐고도 허기를 느낍니다. 우습게도, 누군가의 ‘간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입니다. 그리 보면,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충분한가’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는 방식 또한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울음으로 버티고, 또 다른 이는 침묵으로 견딥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남의 답을 들먹입니다. 들먹인다고 해서 그 답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는 답이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살아내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답 없는 길을 저마다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 불리는 제도는 ‘정답 없음’을 인정한 체제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수의 결정이 늘 옳을 수 없고, 소수의 결정이 언제나 그르지 않습니다. 서로의 답을 이해하려 애쓰는 게 미덕인 까닭도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옳음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살피는 마음에 있고, 혼자보다 함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온갖 반칙과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원칙과 존중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지극한 마음이랄까요.
그렇다고 틀림조차 인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름과 달리, 틀림은 전혀 별개의 것이어서 타협하거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수는 이해할 수 있어도 살인은 용서할 수 없음과 같은 이치입니다. 틀림의 뿌리는, 속이고 훔치고 때리고 빼앗는 모든 짓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도덕과 법률입니다. 도덕이 다름을 살피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법률은 틀림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름과는 동행해도 틀림과는 함께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답 없는 길 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것이 길을 길답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