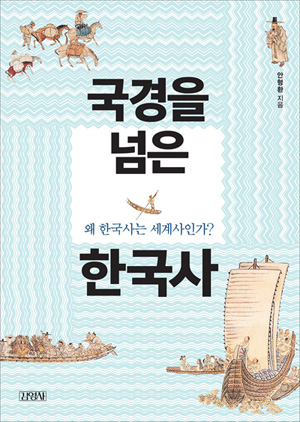
한국사는 한반도와 만주 일부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지 쉽지만, 세계사 전반을 들여다보면 휠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한국의 존재가 발견된다.
이슬람 역사가들은 신라로 이주한 아랍인들을 소개했고, 몽골에서는 고려양이라는 한류의 원조가 있었다.
방송기자 출신인 저자는 ‘국경을 넘은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 속에 한국사를 복원하고 한국사 속에서 세계사를 되살려내고자 한다.
바이칼호수 지역에서 뻗어 나온 고구려 시조 주몽에서 여진족 추장들과 어울리던 야인 이성계까지 한국사와 세계사가 접속한 빛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왜 한국사가 세계사인지 이유를 말해준다. 책에는 한국사 최고 전성기인 8세기 신라, 11세기 고려, 15세기 조선을 뽑아 세계 속 한국의 위치를 조망한다.
8세기 통일신라는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통합한 후 늘어난 토지와 인구를 바탕으로 태평성세를 누렸다. 신라인들은 세계로 뻗어나가 동중국해와 황해, 남해를 사실상 지배하며 해양 대국을 만들었다.
중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이 신라 학생들이었고, 신라의 승려들은 중국과 인도를 오가며 동아시아 불교 철학을 이끌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신라는 가장 개방적인 국제국가이자, 문화선진국이었다.
11세기 고려는 고급 관료에 외국인을 임명하고, 무역항 벽란도에는 서역인들이 드나들었던 개방된 국제 국가였다.
중국(남송)과 수교하고자 하는 왕(문종)에게 신하들은 “장삿배가 줄을 이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진귀한 물자가 날마다 들어오고 있다. 중국과 교통해도 실제로 도움받을 일이 있겠냐”며 반문할 정도였다.
내부적으로 황제국이라고 자칭할 만큼 자긍심이 넘쳤다. 또 끊임없이 북방을 내달렸던 패기 넘치는 국가였다.
15세기 조선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국가였다. ‘조선’하면 답답한 폐쇄국가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세계 최고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노비에게 130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주었던 관용과 개방의 ‘열린국가’였다.
민족문화의 결정체인 한글이 창제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발명품들도 쏟아져 나왔다. 당시 조선의 문화 수준은 동시대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책 뒷부분에선 김춘추와 왕건, 충선왕, 이성계 등 앞선 식견으로 한국사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각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개방과 역사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한 국가가 가장 융성했던 때의 모습은 역시 가장 개방했던 때였고 그 국가 또는 그 국가의 지도부가 폐쇄적으로 돌아서면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많이 보았다. 한국사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김장선기자 kjs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