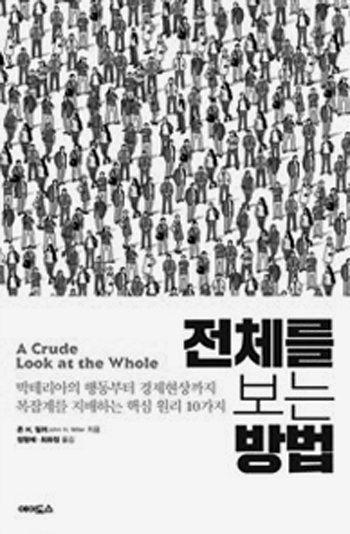
급작스런 주식시장 붕괴나 금융위기 그리고 아랍의 봄 같은 사회혁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날씨 변화에 극도로 민감한 꿀벌들은 벌집의 온도조절을 어떻게 할까?
신경세포 하나 없는 박테리아나 점균류는 어떻게 목표지점에 도달해 미생물을 잡아먹는 것일까?
컴퓨터 거래프로그램의 사소한 오류로 발생한 2010년의 주가 대폭락이 전 세계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대사회는 아주 작은 부분의 국소적 행위가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런 복잡성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흔하게 볼 수 있다.
환원주의라는 19세기의 전통적 방법론에 기반한 기존 과학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등장한 복잡계 과학은 복잡한 현상을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카네기멜런대학교의 사회경제학 교수인 존 밀러는 경제학과 게임이론, 복잡계 적응시스템이론, 경매시장, 협력, 실험경제학 등을 연구했다.
그는 ‘전체를 보는 방법’을 펴내 상호작용, 피드백, 이질성, 소음, 분자 지능, 집단 지성, 네트워크, 스케일링, 협력, 자기조직화 임계성 등 복잡계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 10가지를 통해 복잡한 현상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책은 얼룩말의 줄무늬, 원뿔달팽이의 기하학적 패턴 등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굳이 지적 설계자나 비과학적인 논리에 기댈 필요가 없다고 밝힌다.
복잡한 현상도 아주 단순한 규칙과 원리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존 폰 노이만의 세포 오토마타는 간단한 규칙들만을 가지고 원뿔달팽이의 껍질 패턴처럼 신비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셸링의 인종 분리 모델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모여 살고 타인들과 분리되는지를 아주 단순한 규칙(자신과 비슷한 타입의 이웃이 30% 미만이면 거주지를 옮긴다) 하나를 가진 모델로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경쟁과 배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어떻게 협력이 생겨났는지를 우리는 간단한 두 상태(협력과 배신)를 가진 오토마톤으로 가상적인 세계를 만듦으로써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처럼 책은 복잡계의 핵심 원리들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밝힌다.
기복이 심한 지형에서 높은 곳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신약 개발을 위한 혼합제제 연구에 이용하는 사례나, 박테리아의 행동을 탐구하는 시뮬레이션, 진화론적으로 협력의 출현을 탐구하기 위한 수학 모델 등 학문적 영감을 주는 주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복잡계의 핵심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잡계 전문가이자 옮긴이인 정형채 교수의 본문을 해설하는 풍부한 주석도 책의 이해를 돕는다.
/민경화기자 mk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