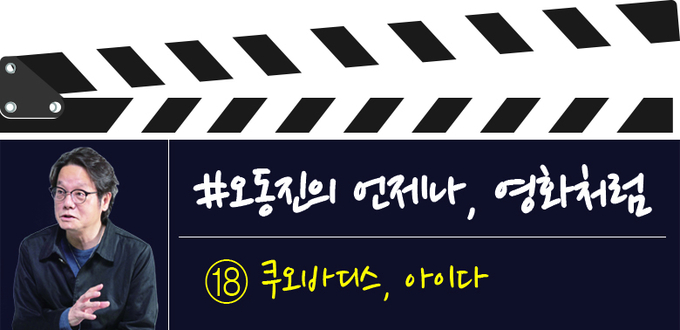
극장가에서 거의 사라진 (극장에서 안 보면 결코 VOD 등을 통해서는 자발적으로 보지 않을) 영화 ‘쿠오바디스, 아이다’는 실로 참혹해서 영화를 보고 있기가 심란하고 불편해진다. 영화는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에서 세르비아 민병대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 학살극을 다룬다.
스레브레니차는 당시 세르비아가 강제로 세운 자신들의 자치 지역이었다. 이곳의 대다수 주민을 차지했던 보스니아 무슬림들은 외곽의 UN 안전지대로 피신하지만 곧 세르비아인들에 의해 분산 수용되는 척, 남자들은 모조리 집단 총살당한다. 잠재적 군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주인공 아이다(야스나 두리치치)는 영화 내내 뛰어다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르비아 군이 UN 안전지대까지 들어왔고 곧 아들 둘과 남편을 잡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과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지금은 UN 통역관으로 일한다. 그녀는 UN군에게 통사정을 해 자신의 가족이 끌려가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나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네덜란드 UN군은 아이다의 가족뿐 아니라 사람들을 구해내지도 못한다. 아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셈이다. 스레브레니차에서는 단 며칠 동안 8000명이 살해됐다.
1992년에 시작돼 1995년에 일단락된 보스니아 사태에서 그리스 정교계의 세르비아 민병대는 인종청소라는 명목하에 10만 명에 이르는 양민을 학살하고 5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을 강간해 임신을 하게 했다.
야만과 짐승의 시간이었으며 2차 대전 이후 가장 파괴적인 분쟁으로 기록된다. 당시 세르비아의 대통령 밀로셰비치는 보스니아 내 세르비안들의 지도자 격이었던 라도반 카라지치를 지원해 이 인종 말살 계획을 실행했으며 그 선봉대는 믈라디치였다. 이들 셋은 이후 전범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비록 감옥이지만 천수를 누리다 사망했거나 여전히 살아 있다.

영화는 짧지만 가장 악랄했던 스레브레니치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끔찍한 학살과 강간이 자행됐음에도 영화는 그 엽기의 스펙터클을 피하려는 듯 모든 장면을 일정한 톤으로 꾹꾹 누르고 있다. 감독 야스밀라 즈바닉의 분노와 그 힘든 인내가 느껴질 정도다. 그보다는 믈라디치 민병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주인공 가족의 시시각각 좁혀 오는 긴장감을 표현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짐승으로 변할 때 얼마나 가공할 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공포의 최대치를 보여 주려 애쓴다.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며 악에 빠져 있을 대로 빠져 있고 음흉하며 음탕하기가 이를 데 없음을 느끼게 해 준다. 이런 인간의 본성이 민족/종교/영토의 분쟁과 결합할 때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는 가를 그려 낸다.

이 영화는 재미를 느끼거나 의미를 찾을 새가 없다. 당시 UN 안전지대에서 벌어진 일을 순차적으로 알아가는 과정과 그 진실의 실체를, 더 나아가 보스니아 내전의 실상을 깨닫는 과정만으로도 숨이 찰 지경이다.
남편과 아이가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 것을 알게 된 아이다가 장벽 위에 서서 캠프 안으로 들어서려는 군중들을 보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감독의 카메라는 철조망 바깥에 구름떼처럼 몰려든 인파를 풀 쇼트로 여과 없이 보여 준다. 사람들의 마음 속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심대한 것이었는가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사람들은 살려고, 생존하려고, 버둥대고 애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수용소 같은 강당에 갇혀 한꺼번에 몰려서 자고, 용변을 보고, 그 와중에 사랑도 나눈다. 그런 등등이 모두 눈물겹다.
이 영화의 최대 미덕은 그러한 일들이 결코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과거의 광주에서도, 지금의 미얀마에서도, 같은 악행이 저질러졌고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학살자 믈라디치는 여자들만을 태운 버스에 올라타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돼서 안됐다만 이건 다 너희 탓이다.”라고 일장 연설을 한다. 보스니아 인들이 세르비아인들에게 반항과 저항만 해 온 탓이라는 것이다.
당시 보스니아에는 무슬림 계 보스니아인과 그리스 정교회 계 세르비안들이 4:3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내전의 원인은 매우 복잡했다. 민족적 콤플렉스 혹은 이유 없는 우월감은 종종 종교적 탄압의 정당성으로 둔갑한다. 세르비안들은 보스니아 내의 무슬림들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용서와 화해도 다 하는 얘기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세르비아 민병대들이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후 아이다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병대의 중간 지휘자급 인간이 딸과 손녀를 키우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의 표정을 도저히 읽을 길이 없다. 저 인간을 죽여서 복수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용서와 화해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 그보다는 무엇보다 역사에 대한 인식과 정당성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얘기하는 대목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가.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가. 아직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에게 물었듯 진정, 쿠오바디스 도미네(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