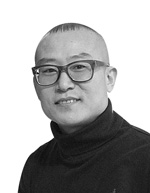
WHO가 밝힌 질병 1만3천여 가지 중에서 500여 가지만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감기약처럼 인간의 두뇌와 신경망을 둔하게 만들어 느낌과 기분만 좋게 만드는 처방이 가능한 수준이다. 96% 이상의 질병들이 아직 인간의 지능영역밖에 있다. 이 정도 지적능력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다해도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로 도약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인공지능이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가진 바둑을 정복했는데 왜 질병은 잘 모를까? 그 이유는 바둑의 빅데이터보다 더욱 무수한 빅데이터들이 생명현상에 있기 때문이다.
비정형 데이터 외에도 아직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범위가 98% 이상일 것이다. DNA 조합은 파악했지만 곳곳의 DNA 조합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여전히 98% 이상 모른다. 태풍을 예방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다닌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거의 없으며 몸과 무의식 그리고 근원을 모를 생각의 단서를 목줄로 삼아 끌려 다닌다. 뇌과학이 발달한 이후 자유의지에 대한 실험에서 매번 0.3~6초 이전에 몸과 호르몬이 긍정과 부정의 반응을 먼저 하며 전두엽은 몸의 명령대로 판단한다.
패가 나쁜 카드를 손에 쥐려고 할 때 몸은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손에 땀이 나는데, 도박의 고수들은 손으로 카드의 정체를 느낀다고 한다. 지능이 우주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인간 세포 내의 미세소관에서 양자인지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세포는 이처럼 영리하지만 우리의 몸과 정신은 거대한 지능의 바다 위에 떠서 모래사장으로 달려가는 파도 위에 뜬 거품일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막강한 자연재해와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이 퍼지면 두려워하며 기도하게 된다.
오래 전 천연두가 마마귀신의 행차인 줄 알고 마마님이 그냥 지나가길 기도하며 제물을 바치던 마음은 종교의 기원이었다. 종교가 신을 만난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종교는 권력의 도구이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을 막는 역할을 했다. 무언가를 먹지 말라는 교리가 생긴 이유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전에 그 음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인이 지키는 종교의례는 유난히도 청결을 강조하면서 전염병을 예방하여 부족과 신도들을 지켜왔다. 질병의 세균기원설이 정설이 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여 두려움보다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과학은 신의 처분을 기다리던 인간들에게 스스로 무수한 도구를 발명하게 하여 자연재해와 치명적 질병을 만날 때 신을 향해 엎드리지 않고 인간 협력자를 구하도록 해주었다.
중세부터 발달했던 과학은 인본주의를 태동시켰고 강화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96%의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한심한 생명과학계에서 새로운 인문학과 인본주의의 단서가 있다. 인간들은 자신의 DNA를 인공지능에게 진단하게 하고 우리 몸 안팎의 다양한 환경적인 변수와 심리적인 흐름들을 연구하게 도우며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의 DNA 정보와 상호작용의 변수들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바둑보다 더 많은 변수를 가진 세포들의 상호작용은 보편인공지능 AGI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법이 보일 것이다. 인공지능들은 인간이 3천년 걸려서 검토할 의료문서들을 3분만에 데이터마이닝하여 인간 연구자에게 다음 검색어를 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50년 정도는 생명과학의 시대가 온다.
다음 인공지능의 과제는 거시 우주와 미시세계에 있으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인간들은 우선 자신들의 몸에서 노화와 죽음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인간들은 ‘호모데우스’가 되기 힘들며 먼저 휴대전화를 몸에 갖다 대는 ‘호모옵티바이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의 책을 보면서 그의 너저분한 얕은 지식과 통찰에 화가 났다. 자칭타칭 최상의 두뇌와 DNA를 가졌다는 유대인 스타가 오랜기간 나오지 않아서 만들어진 궁여지책의 월드스타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