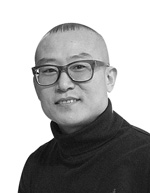
지난해 11월 열린 ‘2017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노동경제학의 대가인 하버드대학교 리처드 프리먼 석좌교수가 기조강연을 했는데, 그는 로봇이 거의 모든 인간의 분야에 진출할 것이며 가격이 저렴해질 거라고 했다. 그 역시 빌 게이츠처럼 로봇세를 언급했지만 빌 게이츠와는 달랐고, 필자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자문위원일 때 주장했던 방향과는 같았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했는데, 이번 리처드 프리먼의 기조강연은 필자가 2010년부터 8년간 허공에 변화를 외쳤음에도 산이 너무 멀어서 늦게 되돌아온 메아리처럼 반가웠다. 또한 필자가 가끔 뵙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포럼에서 “기술변화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어질 법적 제도적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기조연설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서 국민의 관점을 행동하는 해법인문학으로 변모시킬까?
필자는 2년 전 “한국의 로봇세는 생존에 급급한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로봇 도입으로 생존하려는 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로봇산업의 역량을 장애인 고령인구 보조로봇 연구에 온힘을 써야 희망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이번 정부에서 정책으로 채택됐지만 실행력은 차기 정권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로봇세 정책은 한국과 미국이 다를까? 이유는 바로 로봇 수입국과 로봇 수출국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은 로봇도 수입하고 로봇세도 내야 하니 이중고가 된다.
미국은 로봇을 수출하니 로봇 제조 일자리까지 더 길게 유지되므로 로봇세를 재취업교육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운명은 리처드 프리먼의 주장대로 로봇세는 대량실업 대책에 쓰여야 할 것이다. 그는 교육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그의 주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교육은 오히려 해당 분야의 임금을 낮출 뿐이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길거리 노숙자처럼 변해가는 것이다. 보다 더 나은 직업을 위해 공부하고 비싼 교육비를 지출했지만 노동자로서의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더니 이내 더 빨리 가난해지는 현상이 바로 ‘공부리스크’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더 빨리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AI)의 특성과 전망을 보면 바로 나온다. 교육이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있다. 교육과잉에 대해 필자가 만든 별명은 ‘교육당뇨병’이다. 교육당뇨병을 치료하자는 강연에서 필자는 ‘중용’을 끄집어냈다. 학문이란 이름의 기원으로 알려진 중용의 ‘박학심문(博學審問)’은 ‘신사명변독행(愼思明辯篤行)’으로 끝난다. 그런데 마무리가 독행으로 끝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음식을 잔뜩 먹고 운동을 안 해 걸리는 당뇨병처럼 교육당뇨병이 된다. 결국 췌장이 망가져 인슐린 미분비로 체내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즉 에너지를 쓰는 창의성과 유연성이 사라진다.
미래학자들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적인 노동이 가능한 AI와 로봇이 일반직장에 설치되거나 구매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미 신문기사를 대신 써주고 주식투자를 대신하는 컴퓨터도 있다. 요리를 하고 스시를 만드는 로봇도 있다. ‘알파고’는 바둑을 넘어 신소재와 신약을 만드는 곳으로 이동했다. ‘왓슨’은 암의 진단과 치료를 넘어서 거의 모든 분야의 고수가 되어갈 것이다.
2015년 AI분야의 전문가 3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AI의 첨단화와 자동화는 자본가의 힘을 키워주며 노동자들을 쉽게 구하거나 바꿀 부품으로 만들고 있다. 요즘 AI의 발전을 보면 사람보다 뛰어난 학습능력과 신체조작능력, 대인관계의 감성과 창의성까지 갖춘 로봇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필자의 직감으로는 2024년이 인공보편지능 AGI가 출세할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공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논리수학지능’과 ‘언어지능’은 AI가 가장 쉽게 먼저 정복할 대뇌의 기능이다. 과연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 사이에 우리 공교육이 변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