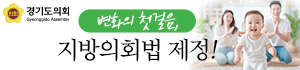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는 지구에 대해 법 개정까지 국토해양부에 요구하는 등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노하우 부족, 법 이해부족으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그렇지 않아도 힘든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유래
2. 왜 하필 공영개발인가
3. 공영개발의 폐해
4. 지구별 쟁점 진단
5. 전문가 제안 및 대안
시는 지난해 3월 12일 남구 도화동 272 일원 94만4천690㎡ 제물포역세권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대의 나지비율이 39.6%에 지나지 않자 시가 선호(?)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여의치 않아졌다.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나지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고 돼 있다.
제물포역세권은 구도심 지역으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부지를 제외하곤 주택과 상가들이 들어서 있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시키기 힘든 지역이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아예 법을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도시개발 제도개선 자문회의’에 참석해 현행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고쳐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지침은 시장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 나지 비율이 50%가 안되는 구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있지만 낙후지역 면적이 전체의 7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시는 70% 제한 자체를 없애달라는 입장이다.
도화지구의 상황은 제물포역세권보다 심각하다.
도화지구는 남구 도화동 43의 7 일원 88만1천여㎡에 대해 인천대 이전부지를 활용해 교육·문화복합 주거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6년 5월 29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인 이곳은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복합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이주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도개공은 2006년 10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환으로 SK건설을 비롯한 21개사로 구성된 ㈜메트로코로나를 복합개발사업자로 지정했다.
문제는 도개공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메트로코로나가 민간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도시개발법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명된 것으로 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 법이다. 이 땅 위에 공동주택을 지으려 한다면 도시개발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도개공 등 공기업이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주거공간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원가 수준으로 무한대 제공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아 이러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도화지구는 이주대책 대상자 540여명 중 240여명만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돼 나머지 200여명의 주민은 갈 곳이 없게 됐다. 도개공은 이같은 상황을 사업초기에 알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