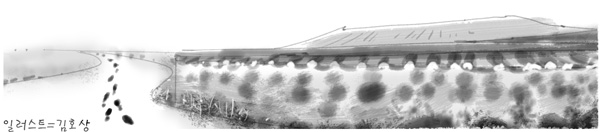
마을을 떠난 길
/안정훈
마을을 떠난 길은 사라진다
소멸의 틈새를 비집고 일어서는
밟혀도 아프지 않는 풀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다
저물어 가는 사람들이 걸어서 온다
이 길을 걸어서 가본 사람은 안다
아픔도 그리움이 될 때
뼈와 풀은 일가(一家)를 이룬다
- 안정훈 시집 『누군가 내 몸에 살다 갔다』(문학의전당, 2014)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시간이 아니라 분리되어 살아 온 삶의 기억이다. 세상을 ‘마을’이라고 부르면 마을을 떠난 발길에게 그 마을의 길도 이미 사라진 것이리라. 밟혀도 아프지 않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저물어갈수록 마을 속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안다. 밟히고 버려지는 아픔만큼 생애의 뼈와 향기는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자리한 이 ‘마을’에서 나는 얼마나 아픔을 견디며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나는 이 마을의 어떤 풍경이 되어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는 심상(心象)의 시편이다. /김윤환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