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날엔 통제사統制使가 있었다는 낡은 항구港口의 처녀들에겐
옛날이 가지 않은 천희千姬라는 이름이 많다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 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이 천희千姬의 하나를 나는 어늬 오랜 객주客主집의
생선가시가 있는 마루 방에서 만났다
저문 유월六月의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을 저녁 소라방등이
불그레한 마당에 김냄새 나는 비가 나렸다
- 백석 시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2005년/다산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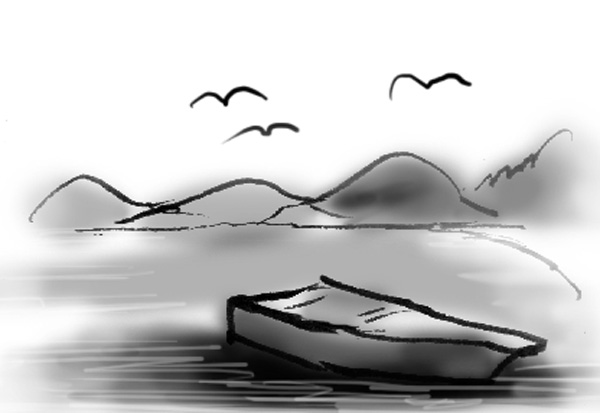
눈으로 천천히 몇 번을 되풀이해서 시를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꼭 그래야만 하는 순서처럼 ‘통― 영―’ 하고 나지막이 발음해 봅니다. 입술 안쪽에 부드럽지만 아련해서 슬픈 무언가가 바닷가에서 나는 것들의 짠내와 함께 슬몃 닿았다가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통영에 가 본 적 없지만 어느 먼 옛날의 통영, 어둑한 객주집 마루방에 천희라는 말 없는 처녀와 한참을 마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천희’라는 이름의 처녀를 만난 적 없지만 아름답고 슬픈 무수히 많은 천희를 이미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천희 중 한 명은 저였는지도 모르겠군요. 천희와 마주했던 시인도, 제가 만났던 천희도, 천희가 만난 저도 하나같이 따뜻한 맨발이었을 것 같습니다. 날은 더 어두워지고 바다 냄새 또한 짙어집니다. 비 내리는 밖을 내다보려고 일어서는데 생선 가시가 발바닥에 밟혀 부스러지네요. 시인도, 천희도, 저도 조개처럼 소리 없이 울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