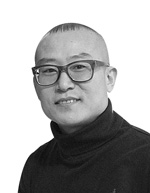
바벨(아령)은 주로 이두박근을 만드는 운동기구다. 그런데 중간을 버리고 무게가 실리는 양끝만 선택하는 양극화전략인 바벨전략은 주로 주식투자에서 사용된다. 전혀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하거나 먼 미래를 보며 리스크가 큰 기술에 투자하는 바벨전략을 교육이나 R&D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만일 이미 발달한 무인자동차나 인공지능의 주력부분에 선진국의 투자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구력과 자본을 투입한다면 지속적으로 후발주자가 될 것이다.
멱함수 지프의 법칙(Power Law)에 따라 투자비만 날리고 수익은 거의 없을 수 있다. 지프의 법칙으로 1위 업체는 84%, 2위는 15%, 3위 업체부터는 전체 시장의 1%를 나누어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무인차 시장은 1위가 95%, 2위가 4.5%, 3위부터 0.5%의 시장을 나누어야 할지 모른다. 인공지능과 무인차는 GPS와 인터넷으로 통합되기에 표준기술을 더 많이 가진 업체로의 편중성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무인차 R&D에도 바벨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인자동차가 사무실이 될 경우 고정된 건물은 그 값어치가 더 떨어진다. 무인차에 가상현실 4D영화가 펼쳐지면 영화관은 다른 용도로 바뀔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 자율주행무인차가 넓이와 구조가 바뀌면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경제의 중심적 소비처가 된다고 했다. 움직이는 차가 사무실이나 집, 카페, 식당이 되면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지역의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여행과 일을 병행하는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우선 구조가 변하는 자동차에 적당한 신소재와 디자인 두 방면에 대한 몰입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무인차는 구조가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서 가볍고 튼튼한 차체에 성능이 좋은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능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무인차 바벨전략이라면 당장 고령자들의 차가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기존 차에 주변감지와 제어기술을 부착하는 수준의 준 무인차로의 튜닝기술이나 훨씬 더 먼 미래형 자동차를 상상하는 연구가 우리 한국에 맞다. 고령운전자 문제를 무인차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적 기술적 격차가 있기에 약간의 연구로 당장 상업화 할 수 있다. 동시에 지금 테슬라 무인차에는 필요없지만 미래 무인차에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자. 이런 선택은 일종의 시간차 바벨전략으로 부를 수 있다.
보다 먼 미래에는 무인차나 집 안의 가구, 가전도 IOT를 기반으로 마치 큐브세포 동물원처럼 바뀔 것이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큐브로 된 로봇이 나오는데, 각 큐브가 살아있는 세포처럼 이어지거나 떨어지는 가구는 MIT 미디어랩에서도 개발하고 있다. 좁은 길만 있는 관광지에서는 차량의 폭이 줄어들면서 날씬해질 것이다. 경비행기 조종실처럼 생긴 무인차는 실제로 날거나 바다 위에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인차의 의자는 우리 건강을 돌보게 된다. 너무 오래 앉아 운동부족으로 혈관문제가 생기기 전에 경고를 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은 평소 의자의 모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수행로봇과 휠체어가 하나가 되어야 고령자가 많은 사회와 어울린다. 의자와 의사가 결합하는 미래가 올 것이다. 졸지 말아야 하는 시간에는 의자가 전기충격을 주거나 각성주파수 음악을 들려줄 수도 있다. 미래 사무실이 될 무인차에는 실감나는 AR·VR기기로 언제든지 가족이나 동료랑 연결이 되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무인차에 적용될 기술이나 디자인들은 많다. 상상해본다면 ▲자율주행차 내부의 카페화 ▲내부에 3D프린터 요리사 배치 ▲자율주행차 내·외부의 트랜스폼 ▲차 지붕에 몇 배 크기로 펼쳐지는 태양고집광전기 천막 ▲무인자동차와 집안을 오가며 의자로 변하는 로봇 ▲타이어는 바다와 늪지대를 건널 수 있게 진화 ▲무인차와 결합되는 탈착 드론 옵션 등등 다양하다. 무인차와 인공지능을 선점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과 바벨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