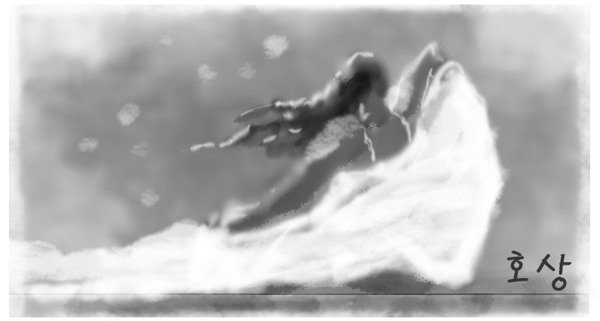
나비
/정동철
하얀 낱장을 펄럭이며
그 여자가 왔다
묵은 풀을 매고
살구나무 쳐진 그늘을 잡아 올리는 동안
담장 너머를 서성거렸다
곤하면 잠깐 마루에 앉아 쉬어가도 좋다고 하였으나
배추꽃 가장자리 미타리꽃 위에 앉았다
다소곳이 고개 숙이고
얇은 낱장만 펼쳤다 닫았다 하길래
산 그림자가 안마당을 덮고 나서야
낱장을 열어보았다
글귀는 한 자 없고
흰 화선지 위에 눈물자국만
눈물자국만 두어 방울 번져 있었다
차라리 펴보지 말 걸
산 그림자가 마을을 다 덮고 난
뒤에야 깨달은 일이다
-정동철 시집 ‘나타났다’

인연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가온 인연을 그저 슬쩍 스쳐 지나가 버리는 가벼움으로 떠나보낼 때가 있다. 한 여자가 왔다. 하얀 낱장을 펄럭이는 그 나비가 담장 너머에서 서성거린다. 잠깐 마루에 쉬어가도 좋다고 하였으나 묵은 풀을 매고 살구나무 쳐진 그늘을 잡아 올리는 화자의 모습에 얇은 낱장만 펼쳤다 닫았다 날아가 버린다. ‘글귀는 한 자 없고 흰 화선지 위에 눈물 자국만 두어 방울 번져 있는’, 뒤늦게 그녀의 슬픔을 알게 된 화자는 못내 안타깝다. 단지 겉모습만을 읽고 떠나보내고 만 인연, 이렇듯 우리는 몇 억겁 시간을 거쳐와 내 곁에 머무는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서정임 시인







































































































































































































